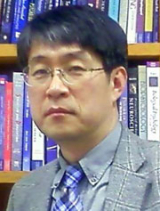
최근 언론을 통해 '인터넷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음해하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인 것 같다. 표적이 된 당사자가 받는 고통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우려와 근심으로 이 현상을 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하여 가능해진, 우리 사회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가볍게 간과하기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현상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문맹, 즉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해왔다. 아이러니컬하게, 인터넷의 보급이 글 읽기보다 글쓰기 능력을 걱정하게 하는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어느 누구나 신문의 기사에 댓글을 단다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기 1400년도에 책의 저자 수는 전체 인구의 0.000001%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 그 후 저자의 수는 매 세기당 10배씩 증가하여 서기 2000년에 약 백만명, 즉 0.01%에 도달했다고 한다. 저자 수는 특히 1500년경 아메리카의 발견과 개신교로 인한 성서의 발간으로 폭등하였으며, 1800년경 산업혁명으로 다시 한번 폭등하였다 한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저자의 수는 불과 9년 만에 10배 증가하여 0.1%(70억 인구 중 약 백만명)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저자'는 100명 이상이 읽은 글을 쓴 사람들로 간주하였을 경우다. 인터넷으로 가속화된 결과다. 이 속도로 증가한다면, 2013년이면 저자의 수는 1천배 증가하여 모든 인류가 저자가 된다고 예측한다.
얼마전 논란이 된'키 작은 사람은 루저'와 같은 발언은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에 대한 강력한 반향이'인터넷 마녀사냥'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피력하는 것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한때 글을 쓴다는 것이 소수의 전유물인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러한 시대를 종결시켰다. 이제 우리는 글의 소비자가 아닌 글의 생산자 시대로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문맹을 걱정하던 사회가 글 쓰는 능력을 걱정하는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