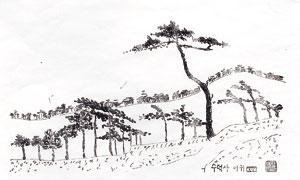
당간지주는 깃발을 매다는 장대를 지탱하는 받침돌을 뜻한다.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고려 때는 유행처럼 번져 전체 사찰로 퍼져 나갔다. 이것의 역할은 사찰이 신성한 영역이라는 표시이며 파사현정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간지주는 선사 시대의 솟대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선종 사찰에서는 참선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는 납자가 나오면 이를 천하에 알리기 위해 당간에 깃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퇴락한 사찰 경내에 홀로 서 있는 당간지주는 몹시 쓸쓸해 보인다. 절집이 번창하여 염불 소리가 계곡에 메아리치면 깃발을 달고 있는 당간 또한 우쭐우쭐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중이 떠나고 신도가 발걸음하지 않는 법당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간지주는 불에 타지 않고 유물 도둑들이 훔쳐가 봐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다음에도 흔적으로 존재하지만 남아 있는 자체가 오히려 송구스럽다.
소수서원도 원래는 숙수사(宿水寺)란 절이 있던 곳이다. 계곡의 물이 흐르다 말고 하룻밤 자고 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편안하고 아늑한 절이었을까.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통치 원리가 억불숭유정책으로 바뀌면서 승려들은 하층계급으로 내려앉았다. 산수풍광이 좋은 이름난 절집들도 권력을 쥔 양반들의 소유물로 바뀌는가 하면 이 절처럼 서원으로 옷을 갈아입고 글 읽는 소리가 염불 소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듯 오랜 전통과 국가의 맥까지도 권력의 지휘권이 바뀔 경우 순식간에 모든 질서가 곤두박질 치고 만다. 지금 우리나라도 종북 세력이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좌파 세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애써 일궈 놓은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박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억불정책도 몇몇 위정자의 머리에서 나온 순간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하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당간지주 옆에 있는 경렴정(景濂亭)에 올라 죽계천을 내려다본다. 붉은 칠을 한 '경'(敬)자가 맞은 편 바위에 새겨져 시선을 끈다. 이는 '경이직내 의이방외'(敬以直內 義以方外)를 한 글자로 줄인 것이다.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경'자 한 자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충효는 물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원 안으로 들어간다. '경'자의 교훈을 이곳 서원의 건축물들이 '경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하고 가르치는 것 같았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유생들이 공부하던 학구재(學求齋)와 지락재(至樂齋)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선비들의 기거 공간인 일신재(日新齋)와 직방재(直方齋)와는 뒤로 두어 자 물러서 있고 기단의 높이도 반쯤 낮게 지어져 있다.
이는 예부터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되며 함께 길을 걸을 땐 왼쪽 뒤편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걸어야 한다는 '경'의 사상을 건물에까지 대입해 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스승상은 어떤가. '경'자의 정반대 개념인 '밟'자와 '때'자가 판을 치고 있다. 학생이 스승을 밟고 때리는 형편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고 2년생이 흡연검사를 하는 교사를 넘어뜨려 발로 차고 때렸으며 경기 성남의 중학생은 "머리 왜 때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여교사의 얼굴에 주먹질을 한 적도 있다. 소수서원 죽계천변에 있는 '경'자가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의 사건이다.
나는 소수서원에 갈 때마다 정자에 앉아 개울 건너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붉은 글씨 '경'을 내려다본다. 우리가 친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스승과, 부모와, 나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홀로 서 있는 당간지주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 제발 저 당간지주를 닮지 말기를.
수필가 9hwal@hanmail.net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