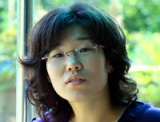
1954년 프랑스 여성작가인 폴린 레아주(본명 안 데클로스'1907~1998)가 발표한 에로티시즘 문학의 고전으로 통하는 'O 이야기'가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심의 결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성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외설과 예술의 경계는 분명한 걸까?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쟁은 수없이 되풀이 돼왔다. 한때 외설 시비에 휘말렸던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나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남회귀선' 등은 그 후 외설이 아닌 고전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문학 외설 시비 1호로 꼽히는 작품 '반노' 역시 긴 법정 시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우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의 변천에 따라, 개인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판이하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외로운 신사'라는 시편에서 성애를 거침없으면서도 더없이 아름답게 노래했다.
독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포르노그라피와 성을 아름답게 그린 에로티시즘, 이 양자의 차이가 한 작품을 예술과 외설로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성질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특정 개인의 사고나 철학이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 작품에서의 성적 묘사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행위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 보기 때문이다. 예술이나 문학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는 작업이라면 사랑이 충만한 성을 묘사했다면 예술이고, 사랑이 없는 성애를 통해 자극만을 충동질한다면 외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술 작품과 외설물은 어떻게든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순수 예술을 가장한 외설물들이 너무도 범람하고 있다. 이를테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이나 본능적 충동만을 자극하는 질 낮은 문학 상품 중에는 성을 팔고 사는 매춘 작품(?) 같은 것들도 섞여 있다. 독자 가운데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여과 없이 파고들어가 이들의 정서를 마구 해치는 무책임한 작가군들에게는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천편일률적인 사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난센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융통성 없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의해 EL 제임스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 2권, 마르키 드 사드의 '소돔의 120일' 등 줄줄이 법정에 서는 곤란함에 직면해 있다.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 않는한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창작인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을 유지하려는 애씀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의 심판을 눈앞에 둔 작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진다.
심지현 문학박사'대구가톨릭대 강사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