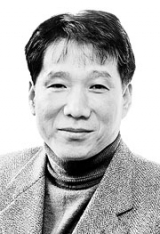
족제비 과의 담비는 우리 민족과 친숙한 동물이다. 한자로는 초(貂)라 하며, 담비 가죽은 초피(貂皮)라고 해, 부여와 고구려 등 우리나라 북부 지역 국가의 중요 특산품이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여의 고위층이 담비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며, 당서(唐書)에는 고구려가 담비 가죽을 동진(東晋)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초피는 옛날부터 왕실 전용품으로 인식됐으며, 조선 때는 정 3품 이상의 벼슬직인 당상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담비 가죽이 귀하다는 것은 옛말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아주 호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을 '돈피 옷, 잣죽에 자랐느냐'고 빗대 말했다. 돈피란 노란 담비의 모피다. 또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따른다는 뜻의 '구미속초'(狗尾續貂)는 귀한 담비 꼬리 대신에 개 꼬리로 뒤를 잇는다는 말이다. 1886년에 창간된 한성주보에 외국계 무역회사가 호랑이를 비롯해 담비, 여우 가죽을 산다는 광고를 냈다는 기록으로 보면 조선 말까지 담비가 꽤 서식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상도에서는 담비라는 표준어보다는 담보, 또는 담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다. 1960, 70년대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담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범 잡는 게 담보'라는 것이다.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담보는 몇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데 얼마나 재빠른지, 당해낼 짐승이 없었다는 것이다. 범을 만나면 몇 마리가 날아다니듯 이러저리 설치는데 범이 이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다 그 빠르기를 감당하지 못해 지쳐 쓰러지고 만다는 우스개였다.
또 장난기가 많은 담보는 그네 타기를 좋아해 밤에는 학교 운동장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캄캄한 밤에 운동장에 날아다니는 새파란 불빛을 보고 도깨비불로 착각하는데, 실상은 그네를 타는 담보의 눈이라는 것이다. 밤에 나다니지 말라는 어른들의 으름장이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담보는 아주 무서운 어떤 것이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담비가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맨 윗자리의 포식자로 나타났다. 나무 열매에서부터 작은 동물과 고라니, 새끼 멧돼지까지 먹이로 삼고, 행동반경이 넓어 생태계 먹이사슬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 지리산에는 10㎢당 1~1.6마리의 분포라 하니, 등산길에서 불쑥 담비와 마주칠 기회도 적잖을 것 같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