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도로 가는 유랑농민(流浪農民) 차림으로 3등 차에 올랐다. 겨우내 입고 나무하던 허름한 농민 옷 솜 속에 지폐를 펴서 넣고 전대에 넣어 허리에도 두르고…두루막에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괴나리봇짐에 보따리도 하나 들고 흡사 유랑농민 그대로 아무 환송하는 사람 없이 쓸쓸히 차에 올랐다.'
100년 전인 1918년 2월, 옛 대구은행원 이종암은 대구 집을 떠나 왜관에서 숨어지내다 미리 마련한 군자금을 숨겨 허름한 옷차림으로 3등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당시 일제의 극심한 농촌 침탈로 살길을 찾아 중국 간도로 떠나는 가난한 백성은 숱했고 일제도 이를 더욱 부추기던 즈음이라 엄한 감시도 잘 피했을 터이다.
일제가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열차로 그가 100년 전, 서울 지나 경의선을 타고 국경 넘어 중국으로 망명했듯이 옛 철도엔 독립운동가들의 숱한 애환이 깃들게 됐다. 일제엔 한국 침탈과 자원 수탈의 수단으로, 또 중국 대륙 침략 군대와 물자를 옮기는 수송의 철길이었겠지만 항일 지사들은 되레 독립운동에 쓴 셈이다.
그렇게 전국의 백성들은 살길과 광복을 위해 생사를 던져 국경 건너 남의 땅 중국 남쪽 상해로, 북경 밖 고비사막 지나 몽골로, 연해주와 극동을 거쳐 동토(凍土) 시베리아와 멀리 유럽까지 험난한 여정에 나섰다. 여운형과 서영해, 몽골의 은인(恩人) 의사(醫師) 이태준 같은 뭇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기록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남북 강산의 통일을 애끊게 소원처럼 노래 부른 까닭도, 끊어진 남북 철도와 도로가 다시 잇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다. 강산을 둘러싼 외세로 허리 잘린 역사도 통곡할 만한데 이제 우리끼리마저 갈래로 찢겨 다투며 날을 새는 판이니 오죽할까. 이제는 달라질 때도 됐지 않은가.
마침 지난 26일 남북과 중국, 몽골, 러시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곧 땅을 파는 착공의 속도전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지만 감회는 남다르다. 철도나 도로, 뭐든 뭍길을 잇는 날, 군자금을 숨긴 괴나리봇짐이나 전대도 없지만 옛 그 길을 마냥 걷고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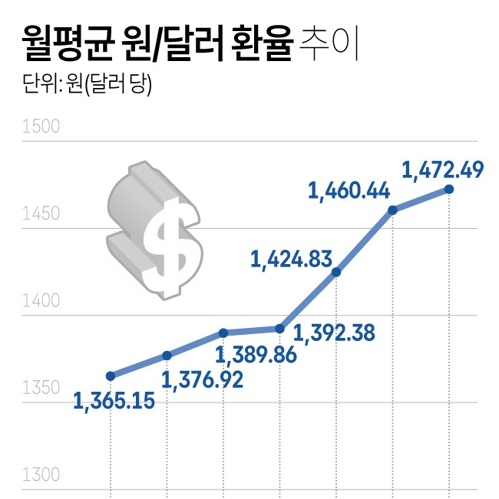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