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날리기는 음력 정월 초부터 대보름 사이가 제철이다. 연은 날리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다. 가로 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뒤로 물러갔다 곧장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면서 자유자재로 날린다. 그리고 연날리기는 개인놀이인가 하면, 높이 날리기와 연줄을 끊어먹는 연싸움도 있다.
'종횡으로 휩쓸어 남의 연과 마주쳐 연줄을 많이 끊어먹음으로써 쾌락을 삼는다. 실을 겹치고 아교를 문질러 매끈하기가 흰 말의 꼬리 같다. 혹은 누런 치자 물을 들여 바람을 거슬러 쨍쨍 울리는 줄이 남의 줄을 가장 잘 자른다. 그러나 연줄을 잘 교차시키는 능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조선시대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에 실려 있다.
연(鳶)이란 종이나 헝겊조각에 가는 대쪽이나 나무쪽을 맞추어 붙이고, 실로 벌잇줄을 매어서 공중에 띄워 올리는 놀잇감이다. 그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삼국사기"의 열전 가운데 '김유신전'에 연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계월향이 성 안에서 연을 띄워 김응서 장군에게 적군이 있음을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놀이로서 뿐만 아니라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연을 날릴 때는 바람에 따라 일정한 높이까지 올린다. 바람만 좋으면 연은 높이 오르고 얼레의 실도 저절로 풀린다. 일반적으로 겨루는 방법은 높이 띄워 올리기다. 얼레로 연줄을 채고 낚는 기술이 능한 사람이면 같은 연이라도 더 높이 띄워 올릴 수 있다. 또한 곧장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가 다시 위로 쳐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의 좌우 무게가 균형을 잃거나 연줄의 길이가 잘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높이 뜬 연은 바람을 많이 받고, 실의 무게가 무거워 연줄이 끊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의 전통적인 형태는 네모진 장방형의 방패연이다. 그밖에 꼭지연․가오리연․반달연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꼭지연은 연의 이마 가운데 둥근 달같이 원형의 색지를 오려 붙이는 표시로서, 그 빛깔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또한 가오리연은 그 형태가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지방에 따라 낙지연․가재미연․꼬리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달연은 연의 이마 가운데 색지를 오려 붙이는 반달형의 표시인데, 그 빛깔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연날리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 며칠 전에 큰 성황을 이룬다. 그때가 되면 '액연 띄운다'며 연에다 '액(厄)'자 하나를 쓰거나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 써서 멀리 날린다. 이때는 얼레에 감겨 있는 실을 죄다 풀고 나서 끊어버린다. 멀리멀리 띄워 보낸다.
김 종 욱 문화사랑방 허허재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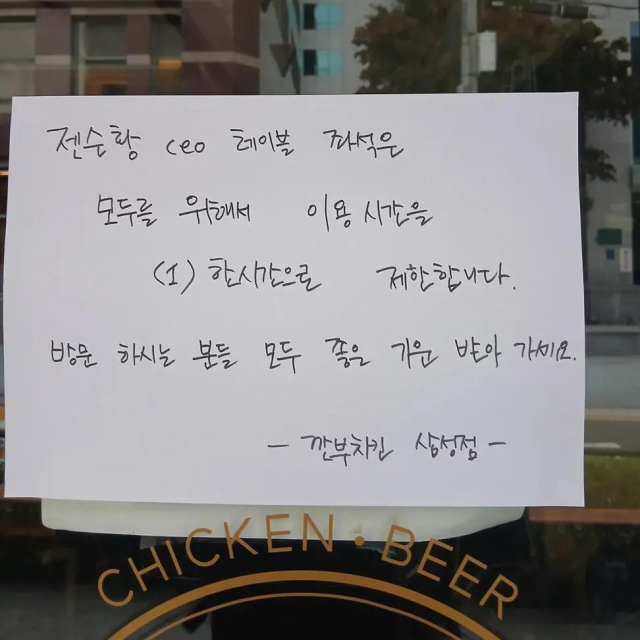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