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 제주는 '킬링필드'(Killing Field)였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는 묘사는 당시 참혹했던 제주도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2000년 제정된 특별법은 제주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영화 '지슬'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의 증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오늘은 누구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11살의 나이로 4·3사건을 겪었던 홍춘호(82) 할머니는 30일 기자들과 함께 무동이왓을 걸으며 당시 기억을 되살렸다. 무동이왓이라는 이름은 '춤을 추는 아이'를 뜻하는 '무동이'와 터를 뜻하는 제주어 '왓'이 합쳐진 것이다. 제주 안덕 중산간 동광마을에 있었던 부락 무동이왓은 4·3사건 당시 주민 160명 이상이 학살된 곳이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토벌대는 소개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해변가로 이주시켰지만, 무동이왓에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홍 할머니는 "마을 이장이 소까이(소개령)를 전하지 않았다. 그때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다 빨갱이가 됐다"고 돌아봤다. 부모님, 동생들과 피난 생활을 시작한 홍 할머니는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동굴 큰넓궤로 이동했다. 큰넓궤는 무동이왓 등 동광리 사람 120여 명이 초토화 작전 중 50일 동안 은신했던 용암동굴이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지슬'(감자의 제주어)의 촬영지기도 하다.
큰넓궤에서의 생활에 대해 홍 할머니는 "억새를 엮어 돌 틈에 끼인 물을 빨아 먹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시간이 지났다. 하늘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큰넓궤도 결국 토벌대에 노출됐고, 사람들은 동굴을 떠나야 했다. 한라산을 향해 가던 주민들은 인근 볼레오름에서 토벌대에 잡혀 총살되거나 서귀포로 잡혀갔다.
홍 할머니는 "서귀포의 단추공장에서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풀려 나온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그 뒤로는 말 못 할 고생의 시작이었다. 남의 집 품팔이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다"고 말했다.
◆육지에서의 관심, 제주4·3 완성의 시작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30일 4·3사건 71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 기자협회 언론인을 초청해 '제주4·3 평화기행'을 열었다.
부족한 제주4·3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행에 함께한 이여숙 제주4·3평화재단 문화해설사는 "4·3사건은 비극적이나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다. 미완성의 4·3을 완성하려면 제주를 넘어 육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해설사는 "제주4·3 사건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제주도민 사이에서조차 남로당 무장대에 의한 양민 희생으로 4·3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정부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에게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됐고, 그중에는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이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1948년 11월 당시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내리고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에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해 총살한다'고 선언했다. 4개월여 진행된 이른바 '초토화 작전' 시기는 4·3사건의 희생자가 집중된 기간이다. 초토화 작전이 끝나고 정부는 당초 "하산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민들을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시키거나 마포, 대전, 전주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냈다. 이 중에는 대구형무소로 송치된 이들도 있었다.
때문에 4·3사건은 제주만이 아닌 전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4·3 사건을 심층 취재한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는 특강을 통해 "많은 제주도민이 형무소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찾아 제주4·3을 조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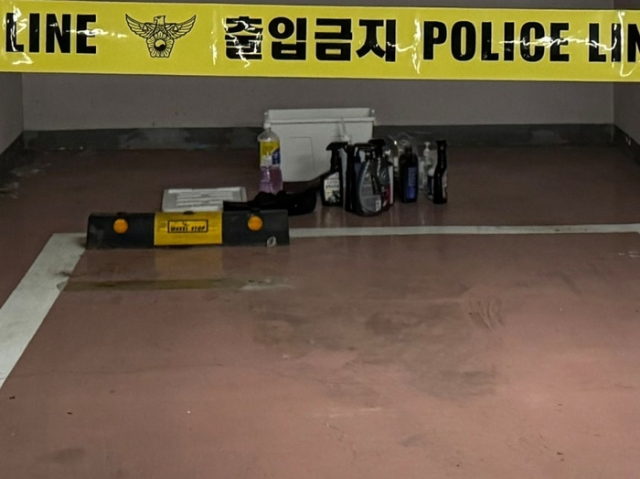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