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영화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내리막을 찍더니, 엔데믹 상황에서도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3월까지 극장 관객 수는 2019년 동기 대비 36% 수준이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도무지 관객들은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범죄도시2'가 1천269만명의 관객을 동원할 때만 해도 낙관적이었다. 누구보다 충성도가 높은 한국 관객을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개봉한 '올빼미'가 332만명을 모아 손익분기점인 210만명을 넘긴 이후 딱히 흥행에 성공한 한국영화가 없었다. 1천만명은 고사하고 300만명, 아니 100만명을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흡인력 있는 한국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수백억의 제작비를 쏟아 부은 영화들도 실망스러운 실패를 맛봤다. '흥행보증수표'로 불리던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가 420만명의 손익분기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150만명으로 주저앉았다. 1주일 간격으로 개봉된 '한산:용의 출현'은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나 전편 '명량'의 스코어(1천761만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이 출연한 '비상선언' 또한 205만명이라는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내로라하는 배우와 감독의 작품마저 이런 성적표를 받았으니, 그 이후 소규모 영화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와중에 그동안 눈길도 주지 않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놀라운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30만명을 넘겼고, 지난 3월 8일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도 380만명을 동원하며 한 달 가까이 롱런을 하고 있다. 마치 '한국영화 정신차려!'라는 시그널처럼 말이다.
최근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한국영화가 드물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만고만한 영화들만 양산됐다. 작가 정신이나 문제의식이란 단어도 사라졌고, 창의력 없이 해외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관객만 믿고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제작한 결과다.

영화는 제작과 배급이 생명인 문화산업이다. 제작이 망가지자 덩달아 배급까지 무리수를 뒀다. 안 그래도 망설이던 관객들에게 과도한 관람료 인상으로 관람 포기를 부추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체인들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매년 입장료를 인상했다. 지난해 급기야 평일 관람료 1만4천원, 주말 1만5천원 시대를 열었다. OTT라는 대체재를 찾은 관객들에게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관객이 극장을 떠나자 뒤늦게 급해졌다. 한국영화 최대의 위기라며 관객의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영화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라고도 한다.
배급계에서는 관람료가 비싼 것이 아니며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람료를 내리라는 관객들의 요구에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재가 유출되고, 대체재가 있고, 투자가 줄어들고, 관람료도 요지부동이니 한국영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다가 홍콩영화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어디에서든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관객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아끼던 한국영화로부터 배신(?)을 당한 느낌일 것이다. 텅 빈 극장을 보면 왜 이렇게 놀릴까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극장은 그동안 가장 편한 문화공간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극장만한 곳이 없었다.

관람료를 낮추기 어렵다면 영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됐으면 좋겠다. 예전 단관시절에는 극장마다 관람료가 달랐고, 영화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개봉관이라도 '전쟁과 평화'처럼 러닝타임이 긴 영화는 더 비쌌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던 것이다. 요즘처럼 3시간이 넘는 '아바타'와 8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동일한 관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극장 체인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계열사 혹은 자사로서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플러스엠과 수직계열화 돼있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로 제작사가 극장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작사가 배급과 극장업까지 겸하면서 대기업화했다. 그래서 스크린 독점, 부익부 빈익빈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다. 이정도 힘이라면 충분히 한국 관객을 달랠 힘이 있지 않은가 묻고 싶다.
김중기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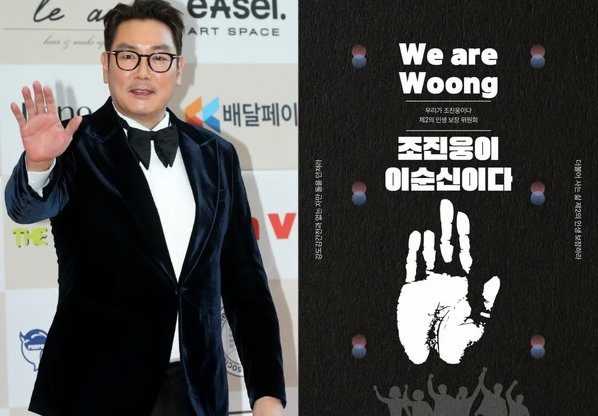
![[단독]](https://www.imaeil.com/photos/2025/12/09/2025120916495497381_l.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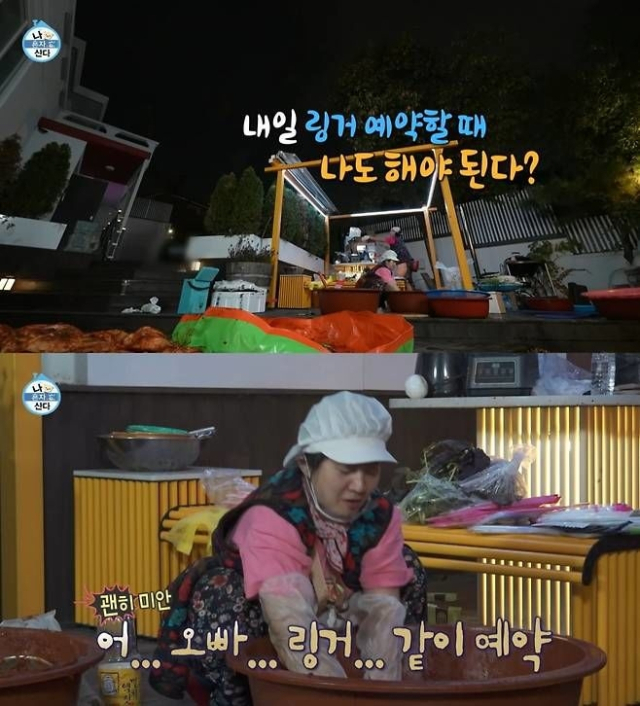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주호영 "'당심 70% 상향' 경선룰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