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 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조선시대 사람'이 된다. '꼰대'가 되는 것이다. 남의 얘기 할 것도 없다. 자식들조차 부모의 충고에 표정부터 달라지거나 귀를 닫아버리기 일쑤이다. 어른들이 쓰는 '예전'이나 '요즘'이란 단어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일방적인 과거 지향이나 권위주의적 함의를 지닌 말머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공자가 활동했던 2천500년 전에도 '요즘 아이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동서고금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세대간의 갈등이야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사뭇 심각하다. 특히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향해온 현대사의 격랑 속에 주거 문화가 핵가족화하면서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아빠 엄마는 직장 생활과 돈벌이에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마주 앉을 기회가 잘 없다. 부모는 그저 돈만 잘 벌면 되고, 자식은 그냥 공부만 잘 하면 그만이다.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은 필요없다.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 조부모의 얼굴은 더욱 보기가 어렵다. 조손(祖孫) 간은 혈연관계일 뿐 정서적인 교감이 거의 없다.
세태가 그러하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하면서 가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의 의식이나 규범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호칭(呼稱) 문화의 파행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작은아버지나 숙부를 부르는 호칭이 '삼촌'으로 통용되고 있다. '삼촌'은 아버지 형제의 촌수를 나타내는 것이지 호칭이나 지칭이 아니다. 더구나 술집 종업원도 '삼촌'이라 부른다. 식당 여종업원은 '이모'로 통한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50대 중반 이상은 낯선 근무자에게 '아버님' '어머님' 소리를 듣는 게 일상화되었다. '아버님'은 남의 아버지를 칭하거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들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장인에게도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내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TV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뒤죽박죽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빠'라는 호칭도 문제이다. '아빠'는 어린아이의 용어이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든 30,40대 남녀도 여전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 손자를 본 50,60대 남성이 80,90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날도 멀지 않았다. 그뿐인가. 결혼한 여성이 '아빠'라고 소리치면 친정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대답하는 세상이다.
'오빠'라는 호칭도 그렇다. 친오빠를 비롯해 남친이나 남편을 부를 때도 사용한다. 호칭의 오용과 혼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언어의 근간인 동사도 왜곡되었다. 언론에서도 상용하는 '전해졌다'는 표현이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전했다는 것인가. 시험을 치르는게 아니라 '치러졌다'고 하고, 풍경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밥도 먹는게 아니라 '먹어지는' 것인가.
우리 언어와 문장에서 주체가 사라지고 일본어식 사동형과 영어식 수동형의 동사가 난무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이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미국 문화에 혼을 빼앗겼던 20C도 아닌데.... 우리 말과 글을 교란하는 문법 파괴와 국적불명의 외래어 범람 현상이 점입가경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외계어의 나열과도 같은 아파트 이름일 것이다.
이제는 행정용어조차 외래어 남용이 대세이다. '거버넌스' '라운드 테이블' '로드맵' '마스터 플랜' '매칭펀드' '메타버스 플랫폼' '스모킹 건' '싱크 탱크' '아카이브' '언택트' '옴부즈맨' '이니셔티브' '클러스터' '태스크포스' '팸투어'.... 외래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의 언어생활과 국가의 행정행위까지 뒤뚱거릴 지경이다. 이 또한 '글로벌 시대의 메가트렌드'인가. 중국과 일본도 이 모양일까?
우리 한글은 교육 수준이 낮은 서민 언어이고, 서양에서 온 외래어는 학식이 높은 귀족층 언어인가. 한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다. '국수'와 '국시'의 차이에서 시작한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이다.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점빵'에서 판다.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점빵에는 '아지메'가 있다.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메는 '얼라'를 업고 있다. 그리고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잔다.... 서울말을 선호하고 사투리를 천시하는 문화를 빗댄 이 유머의 국제적 변용이 바로 외래어를 선망하고 우리말을 폄훼하는 오늘의 우리 언어문화가 아닐까. 서양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식 외래어를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려면 국제화된 남한말을 새로 익혀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사의 금자탑인 대하소설 '혼불' 완성을 위해 17년 세월의 혼신을 바친 작가 최명희는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라고 했다. 한국의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었던 '김치'와 '비빔밥'이 이른바 'K-FOOD'라는 이름으로 일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실감하는 경이로운 한류(韓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류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현상인가. 유서깊은 한국 풍속의 반영이고 역동적인 한국민의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신문화 수용의 결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김치와 비빔밥에 버터를 집어넣는 역주행을 일삼고 있다. '정신의 지문'에 온갖 낙서와 황칠을 해놓고 '그라피티'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나랏말싸미 뒤틀린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면, 정신줄을 잃어버린 한류의 내일이 걱정이다.
조향래 대중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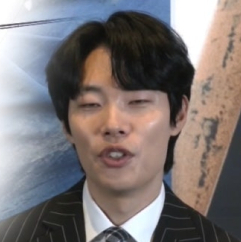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북한,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