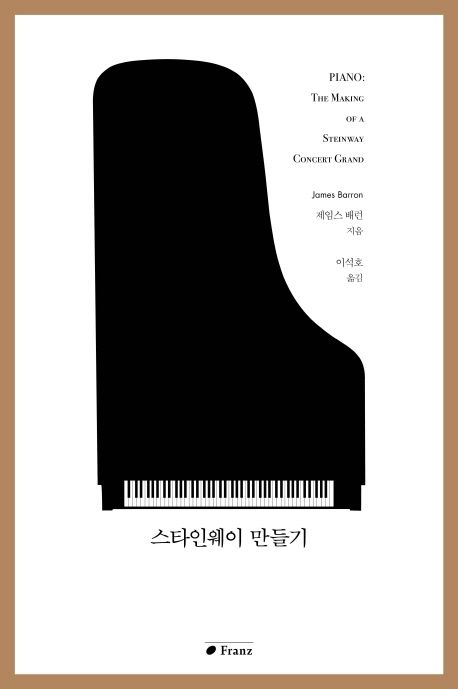
2022년 6월 18일.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하루 전날, 임윤찬은 함부르크산에서 뉴욕제로 결선 연주용 피아노 교체를 요청한다. 호로비츠와 미켈란젤리와 치머만이 전용비행기에 싣고 다니던 그것. 스타인웨이 앤 선스의 콘서트 그랜드다.
1853년 3월 5일. 하인리히 엥겔하르트 슈타인베크와 그의 아들들이 창업한 콘서트 피아노의 대명사 스타인웨이 앤 선스(Steinway & Sons). '뉴욕 타임스' 기자 제임스 배런이 쓴 '스타인웨이 만들기'는 스타인웨이 앤 선스의 대표 모델 '콘서트 그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공정을 책임진 장인과 400여 명의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K0862가 콘서트 그랜드로 만들어지고 CD-60이라는 고유번호를 받아 스타인웨이의 일가가 되기까지, 즉 500년 전의 나무가 콘서트 그랜드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르기까지 11개월의 여정을 쫓는다.
캐나다 퀸샬럿제도의 가문비나무 숲에서 뉴욕 스타인웨이 홀의 지하까지 샅샅이 훑는 저자는, 림과 철제 프레임과 울림판과 해머를 얹고 칠을 받고 광택을 내고 조율을 거치며 보낸 열한 달의 대미를 장식할 (어느 콘서트나 페스티벌의) 데뷔 무대까지, 숨죽인 채 지켜본다. 이를테면 '스타인웨이 만들기'는 "공연기획자들 눈에 들고, 성질머리 고약한 연주자들을 만족시키고, 엄격한 평론가들의 평가를 받고, 완벽주의 조율사들의 손길을 거치기"에 앞선 긴 여정의 기록이자, 말로만 듣고 소리로만 경험한 스타인웨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림(테두리) 모양을 잡는 작업은 전통의식을 치르듯 매일 오전 9시 45분에 이루어진다. 직원들은 피아노와 회사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콘서트홀과는 인연이 희박하다. 작업장 곳곳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은 소프트 록과 재즈가 압도적이다."(33쪽)라는 대목은 무척 흥미롭다.
주목할 건 436쪽짜리 책을 종착지까지 견인하는 저자의 필력이다. 예컨대, 제임스 배런은 "세상이 내려두고 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쪽을 택했다"고 스타인웨이의 역사를 간명하게 요약한다. 뉴햄프셔 주에서 벌목된 단풍나무가 하치장을 거쳐 공장으로 들어오고, 나무가 가공되어 피아노로 만들어지려면 "그전에 먼저 가구가 되는 과정"(103쪽)을 거쳐야 한다면서 "피아노 안쪽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손가락에서부터 45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자그마한 부품들이 한바탕 지르박 춤판을 벌인다."(271쪽)며 한 세계를 통찰한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스물네 단계의 공정을 세밀하게 확인했고, 각각의 장인들을 만나고 노동의 역사를 살폈으며, 뉴욕제와 함부르크제의 차이(암 형태와 케이스 안쪽 코팅과 래커. 함부르크에서 만든 스타인웨이는 뉴욕제보다 더 반들반들 윤이 난다)도 알게 됐다. 창업주 일가의 가십이나 에피소드보다 지금,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을 놓치지 않으려는 저자의 관점이 마뜩하다.
책의 마지막은 K0862가 CD-60 콘서트 그랜드로 바뀐 이후의 후일담이다. 저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대한 추적이 마무리될 때 즈음, 11개월을 함께 했던 공장 책임자와 작업자의 근황에 대한 소개도 빼놓지 않는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승진했으며 또 누구는 여전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노동에 대한 찬미. 마치 한 편의 장대한 다큐멘터리를 끝낸 기분이랄까. 책을 덮자마자 나는 호로비츠가 귀국연주회에서 앙코르곡으로 택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들었다.
영화평론가



































댓글 많은 뉴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한동훈 "윤석열 노선 끊어내야"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설 자리 없어…'朴·尹·대한민국 잡아먹었다'더라"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