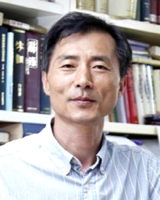
세상 공기가 싸늘하고, 인생사는 삐걱대는 듯. "담벼락은 말을 잃은 채 차갑게 서 있고, 바람맞은 풍향계만 덜거덕대누나." 횔덜린의 '반평생'이란 시를 읽으며 공감한다. 요란스럽고 음산한 시대의 불안에 대해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치소에 갇혔고, 현직 대통령은 내우외환에 묶여 있다. 불투명한 대미 관세 협상 건으로 민심이 뒤숭숭.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쉼'을 택하고, 기업도 자영업자도 각자도생에 안간힘이다. 민생고에다 인생고마저 떠안은 느낌. 이런 가운데 민생 회복 지원금에 다들 잠시 달콤해 하는 듯한데, 자연스레 아래의 불교 우화가 떠오른다.
한 사람이 광야를 걷다가 험악한 코끼리에 쫓겨 달아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다가 다행히 나무뿌리가 드리워진 어느 빈 우물을 발견. 그는 얼른 나무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런데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 위를 쳐다보니, 아뿔싸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부여잡은 나무뿌리를 번갈아 갉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아래를 보니, 우물 안 사방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머리를 쳐들고, 우물 밑바닥에는 독룡마저 도사리고 있다. 그는 독룡과 독사가 두려운데다 나무뿌리마저 끊어질까 무서웠다. 그때 마침, 머리 위의 나무뿌리에 매달린 벌집에서 똑똑 다섯 방울의 꿀이 떨어져 내렸다. 잠시나마 그 달콤함에 빠져 즐거워했다.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자 벌떼가 흩어져 내려와 사람을 쏘아댔다. 그뿐인가, 들판에서는 불이 타올라 매달린 나무마저 태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에 대한 적나라한 비유다. 『비유경』 등에 보인다. 이야기 속에서, '광야'는 끝없는 '무명의 긴 밤'을, '한 사람'은 '중생'을, 코끼리는 '무상'(無常)을, '우물'은 '생사'를, '험한 언덕의 나무뿌리'는 '목숨'을, '검은 쥐, 흰 쥐 두 마리'는 '밤과 낮'을, '나무뿌리를 갉는 것'은 '찰나 찰나로 목숨이 줄어드는 것'을, '네 마리의 독사'는 몸과 바깥세상을 구성하는 인연 따라 해체될 '지수화풍'을, '벌꿀'은 '오욕'(재물욕・식욕・색욕・명예욕・수면욕)을, '벌'은 '삿된 소견'을, '불'은 '늙음과 병'을, '독룡'은 '죽음'을 뜻한다.
혼란이 끊이지 않는 세월엔 매사 매끈한 마무리라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들은 "잘 마침이 있다"는 '유종'(有終) 두 글자를 곱씹곤 했다. 남명 조식의 사상을 계승한 진주 사람 겸재 하홍도가 그랬다. 48세 이후, 그는 겸손할 '겸'(謙) 자에 빠져 살았다.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과 '경의검'(敬義劍)이라는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닌 조식의 기개가 돌연 '겸' 한 글자에 응축된다.
그가 주목한 것은 『주역』의 겸괘다. 그래서 겸재라는 호를 지어 벽에다 써서 걸어두고, 바깥일과 연루되지 않으려 했다. 그의 처세에 기준이 된 구절은 "겸손은 어디에나 통한다. 그런 군자는 잘 마침이 있다"(謙, 亨, 君子有終)는 괘사였다. 아울러 그는 융산 이씨의 다음 설명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겸손하면서도 잘 마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는 이 '잘 마침'을 깊이 음미하며 살다 갔다.
잘 마침은 짧은 한순간에도, 사시사철이 이어지는 긴 시간 속에서도, 일생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다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당연)에 충실할 뿐이다. 명나라의 여곤이라는 사람은 끙끙 앓고 나서 쓰고, 쓰다가 앓고 하여 30년 걸려 『신음어』라는 책을 완성했다. 여기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당연'에만 신경 쓰지 '우연'에는 기대지 말란다.
"일에는 '당연'(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자연'(저절로 그러한 것)과 '우연'(인과 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군자는 당연을 다하고서, 자연에다 맡기며, 우연에는 미혹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인은 우연에 구애받고, 자연을 배반하고, 당연을 버린다. 우연에 기댈 것은 못 되나, 우연에 사로잡혀 당연을 잃어버리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나아가 여곤은 '화와 복',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인간의 마땅한 도리에만 주목하라고 권유한다.
"화와 복은 운수이다. 선과 악은 사람의 일이다. 대개 운수라는 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래서 선하면 복, 불선하면 화인 것이 반. 선해도 화, 불선해도 복인 것이 반. 선하지 않아도 불선하지 않아도 화와 복인 것이 반. 화와 복은 들쭉날쭉. 그래서 군자는 화와 복을 논하지 않고 하늘의 도리를 논하며, 이익과 손해를 논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논한다."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다(事有終始). 무엇이든 잘 마쳐야만 좋은 시작이 뒤따른다. 잘 시작함은 결국 잘 마침을 위한 것. 모든 시작에는 이미 마침이란 게 준비, 진행되고 있다. 마침이란 꼭 생의 마지막인 죽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마침과 시작"(終始) 그리고 "군자는 종신토록 남들과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다"(君子, 有終身之憂)의 줄인 말로 보아야 한다.
나라의 리더에겐 수신과 치국이 관건이나 '오만'하면 다 이겨놓고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큰 주먹인 민심, 어디로 튈지 모른다. '잘 마침'이 참 어려운 시기임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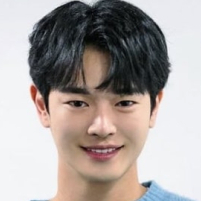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