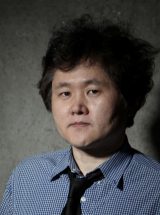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경주는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품어온 도시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이곳은 수많은 왕릉과 유적이 어우러져 '역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 이곳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는 지금, 우리는 '경주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문제는 경주의 풍경이 점차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재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젊은 감성의 거리, 세련된 카페와 숙소가 늘어난 덕분에 방문객은 늘었지만, 그만큼 원주민은 밀려나고 일상의 공간은 낯설어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의 홍대나 제주 구도심만의 일이 아니다. 왕릉과 유적지 주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역사도시 경주는 이제 '보존'과 '관광', '생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경주는 이미 자체 경관조례와 역사도시 경관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경관의 품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그 기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민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다. 유적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라면, 유적의 울타리 밖에서도 '역사도시의 품격'이 느껴져야 한다. 반대로 시민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도 일상의 경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보존구역, 선을 긋듯 나뉜 도시 구조는 결국 '살아있는 도시'의 표정을 잃게 만든다.
신경주역 KTX 개통 이후 경주는 당일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진정한 역사도시는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 짧은 관람이 아니라 체류를 통해 도시의 시간과 결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곳은 비로소 역사도시로 완성된다. 유적과 도심을 잇는 교통체계, 지역민이 주도하는 콘텐츠, 숙박과 역사 체험이 결합된 문화 환경이 함께 마련될 때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다가올 APEC 회의는 경주가 자신만의 경관 철학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다. 관광객의 눈에만 맞춘 '보여주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유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함께 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경주의 역사경관은 단순한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그 시대가 도시를 대하는 태도의 결과다. 세계가 주목하는 APEC의 무대 위에서, 경주는 그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첫걸음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