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의성·영덕·청송·영양. 지난봄 전국을 뒤흔든 초대형 산불의 불길이 꺼진 지 8개월, 현장의 재는 식었지만 주민들의 시간은 멈춰 있다.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최근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실시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실태 조사' 결과는 그 멈춘 시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집과 산림이 타 버린 재난' 뒤에는 또 하나의 재난, '권리의 부재'가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64%는 주택 피해를 100%라고 답했다. 경북의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부를 앗아간 사건이었다. 하지만 회복은 느리고, 도움은 얇았다. 복구지원비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보상금 산정 근거를 "전혀 모른다"는 주민은 40%대에 달했다. 지원 기준도, 산정 방식도 설명이 없었다.
문제는 보상 체계만이 아니다. 세입자는 살던 집이 전소돼도 500만원 남짓을 받고, 생활을 함께 채우던 물건 손실은 보상 항목에조차 들지 않는다. 실질 거주 여부보다 서류상의 '법적 지위'가 보상 여부를 가르는 현실이다. 산불 앞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였다. 하지만 행정 앞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었다.
산불특별법 역시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 응답자의 80%가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70% 가까이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 알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없다면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행정의 효율이 주민의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심리적 후유증이다. 87%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 수준에 해당했다. 집과 생업 기반을 잃은 현실적 충격, 보상 과정에서의 불신, 장기 임시 거주와 불안정이 뒤섞여 마음의 회복은 더디다. 재난은 단지 불에 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긴 시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행정 편의의 산식'을 넘어, 피해 주민이 재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짜여야 한다.
우선, 보상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다. 산정 기준과 조사 절차, 민간 성금의 규모와 배분 내역은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또, 주거·생업 회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중고가 보상에 신품 구입을 요구하는 모순 등은 더 이상 손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할 문제다. 세입자·무허가 주택 거주자·소상공인·임업 종사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법과 시행령이 '서류상 집주인'을 중심에 두는 한, 피해는 계속 불평등하게 누적된다.
재난이 잦아지는 기후위기 시대, 산불특별법은 특정한 사건을 수습하는 단기 법이 아니다. 이후의 모든 재난에 적용될 새로운 기준이 된다. 재난 회복은 건물을 다시 짓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삶을 세우는 과정에는 반드시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시행령은 그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는 구조여야 한다.
불은 지나갔다. 회복은 지금부터다.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주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정부는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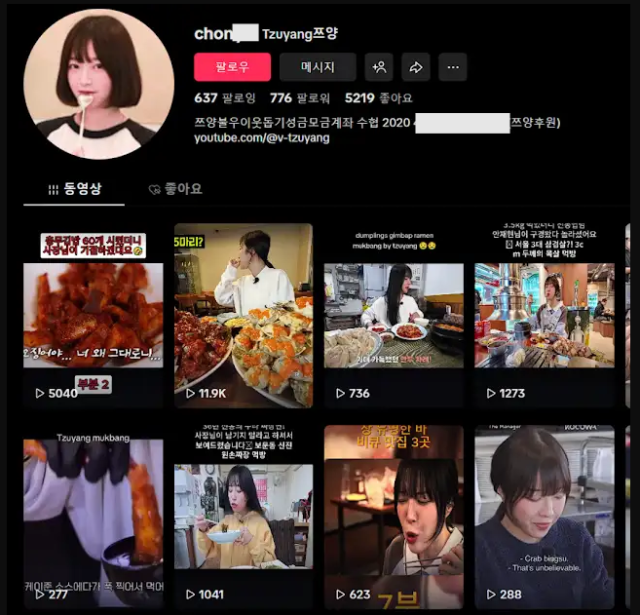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