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지역에서는 성한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대구시에 등록된 158개 주택건설업체중 18%에 달하는 28개 업체가 지난해 부도 또는 실적이 전혀 없어 등록말소 처분됐다. 특히 지역 대표기업들의 경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앉았다.
주택업계 '빅3'였던 청구.우방.보성은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섬유업계 양대산맥인 갑을과 동국도 워크아웃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내노라하던 화성산업.대구백화점.서한.남선알미늄도 워크아웃 대열에 끼어들었다. 지역민들이 공들여 유치한 삼성상용차도 아직 회사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계는 타시도에서 지역 대표기업들이 이처럼 허망하게 몰락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를 반문한다.
주택건설업체 한 임원은 "시가 지난 민선 4년동안 해외시장 개척,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기업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을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업체대표들은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모 업체 대표는 서울정가에 상당한 로비력이 있는 경쟁업체 오너의 도움을 얻어 부도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앙정부와 기업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대구시는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업체들은 또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시에 정책적 배려를 호소했지만 얻은 것이라곤 법정공방 뿐이었다고 푸념한다. 지난해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구시에 납부한 부지매입 계약금 21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시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법원판결을 통해 계약금의 31%를 돌려받았지만 시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다. 이 바람에 민선초기 긴밀한 협조체제이던 대구시와 주택건설업체들의 관계는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선 시가 업체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는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능력, 부도위험, 실적저조 등을 이유로 지역업체들을 외면해왔다는 주장이다. 지역 레미콘업계는 지하철 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의 분리발주를 수차례 시에 건의했지만 거절 당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들이 1천400억원대 규모의 지산.안심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특혜시비를 제기했으나 이를 귓전으로 흘려들어 급기야 법정문제로 비화됐다.
자동차 쪽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3년전 성서과학단지내 아파트 허가, 옛 제일모직 부지 3만3천700평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줘가면서 삼성상용차를 대구에 유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차 빅딜때 부산시는 지역 경제계 등과 연계, 빅딜반대에 적극 나선 반면 대구시는 방관하고 있었다. 상용차 보호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경제계의 한목소리에도 불구, 형식적인 대책회의만 한차례 개최했을뿐이다.
상용차는 아직도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천800억원의 그룹 신규자금 지원, 1억달러 규모의 외자도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소형트럭 10만대 레저용차량 10만대 등 20만8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춰야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나 8천대 수준의 대형트럭 및 일부 소형트럭 생산시설만 갖췄을 뿐 2년째 아무런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상용차 한 관계자는 "시가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상용차 팔아주기 등 대책에 나섰지만 본질적 문제에는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타 시.도의 경우 조례까지 고쳐가며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시책방향을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구호 뿐인 지역기업 살리기 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 기업살리기에 시 경제시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경제계 한 관계자는 "시 재정이 바닥나 지역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기업이 회생해야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鍾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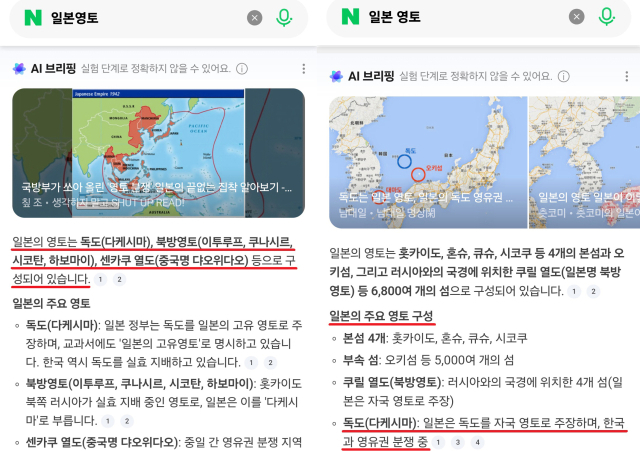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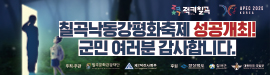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