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후기의 화성(畵聖) 겸재 정선(鄭敾,1676~1759)은 초기엔 중국화풍을 철저히 모사하는 방식으로 그림수업을 쌓았다. 이후 중국 북방화법의 선묘와 남방화법의 묵법을 조화시켜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한 조선 고유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를 창안, 완성시켰다.
정선이 살았던 숙종시대와 영·정조시대는 실학이 융성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성리학이 독자적 학문체계를 갖춰 예술에 반영됐으며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이러한 시대적·문화적 배경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심사정,강세황,최 북에 이어 김홍도의 풍속화를 낳으면서 크게 발전했고 미술뿐 아니라 판소리, 김만중의 국문소설, 이병연의 진경시, 동국진체의 글씨 등 '진경시대'의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그러나 조선 말기 문화의 쇠퇴로 진경산수화도 명맥이 다하게 됐다. 조선 멸망, 일제강점 시기와 해방을 거쳐 서양의 근·현대 미술이 유입됨에 따라 전통미술이 설 자리는 크게 좁아졌다. 더구나 최근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동·서양화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일부터 19일까지 팔공산자락 공산갤러리(053-984-0289)에서 열리는 '김현철의 진경산수화전'은 거의 맥이 끊어진 전통 진경산수화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화단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천 출신으로 간송미술관 연구원인 그는 서울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뒤 20년 가까이 진경산수화를 연구해 온 작가. 그가 몸담고 있는 간송미술관의 민족미술연구소는 전통미술 부흥을 목적으로 최완수 연구실장이 20여년간 유망한 미술학도들을 뽑아 과거 정선이 그러했듯 '임모(臨摹:모사) 후 화풍 완성'의 철저한 도제식 수련을 거치게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정선의 그림을 임모한 작품 위주로 세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진경산수화를 선보인다. 지·필·묵을 사용, 유려하면서도 세밀한 선, 절묘한 여백의 조형미로 산수를 표현, 전통미술의 심원한 깊이를 드러내 보인다.
국내 화랑들과 평론가들은 이른바 '간송파'라 불리우는 이들 간송미술관 작가들이 오랜 수련후 다져진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보고, 대규모 진경산수화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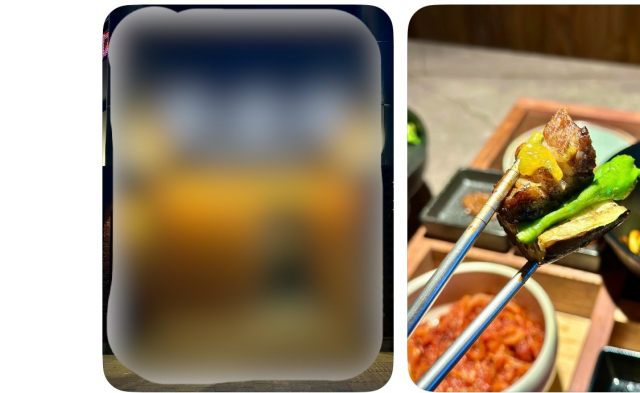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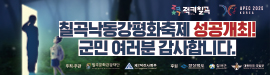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