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게임을 연구한다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게임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신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요령을 깨우치지 못한 탓에, 대개 '글쎄요'라고 얼버무리기 일쑤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해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다. 1980년대 중반 나는 '텔레비전 무용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바보상자의 역습'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한다. 20년 만에 텔레비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물론 텔레비전이 그랬다고 게임 또한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텔레비전과 게임은 누가 보더라도 경우가 다른 매체이기 때문이다. 하긴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텔레비전과 화면 속으로 빨려들어갈 듯한 집중력으로 직접 뭔가를 '하는' 게임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게임은 '악'이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을 방해하고 성적을 떨어트리는 골칫덩어리고, 세상을 더욱 흉흉하고 삭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산업적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 아이만큼은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학생 총기 사건들의 배후에는 늘 비디오게임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소박하고 유쾌하기보다는 그로테스크하고 현란하고 어두운 느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게임산업이 발전하고 대중문화의 한 줄기로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 학교의 폭력 사건은 감소 추세에 있다. 물론 게임이 폭력 사건을 줄여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기 아까운 현상이다. 더구나 폭력적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적 성향에 원인이 된다는 뚜렷한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탓인지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논의는 요즘 들어 커다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걱정은 게임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문제다.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또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게임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학업에도 취미를 가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2시간을 경계로 그래프의 방향이 뒤집어진다. 하긴 게임이 아니더라도 지나쳐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지금의 아이들에게 게임은 가장 중요한 매체이며, 즐거움이고 문화이다. 이들로부터 게임을 빼앗을 수는 없다. 어른들이 갤러그와 인베이더를 기억하듯이 이들 또한 어른이 되면 라그나로크와 메이플 스토리를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부모들에게 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임에 대해서 정작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오로지 게임을 하는 '시간'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두 시간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낭보를 전하는 부모들에게 묻는다. "댁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인가요?" 어떤 부모들은 그 게임의 제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게임은 그냥 다 똑같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죽어도 해야겠다니 조금만 하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 일요일 두 시간을 '18세 이용가'라고 찍힌 성인용 게임으로 보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8금(禁) 게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랜드 테프트 오토'를 즐기는 초등학생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게임을 하는 자녀들이 걱정된다면, 이제 자녀들의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게임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부모들의 관심 밖에서 혼자 하는 것이다. 주말 오후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끔은 아이들과 한 판 즐겨보시기 바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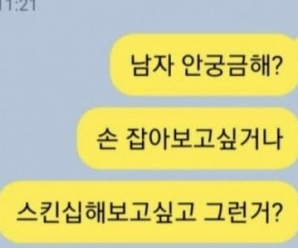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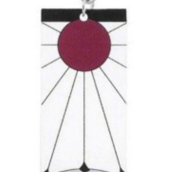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