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두류도서관에서 '괴단광감록'(槐壇曠感錄)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수목분류체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시대에는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모두 괴목(槐木)이라고 표기했다. 이 때문에 제목으로 볼 때 느티나무나 회화나무에 관한 이야기려니 하고 살펴보았더니 예상이 적중했다.
도촌(桃村) 이수형(李秀亨'1435~1528) 선생이 심은 회화나무가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은 본관이 우계로 군자감 주부를 지낸 아버지 이경창과 어머니 순흥 안씨 사이에 1435년(세종 17) 서울에서 태어났다. 개국공신 후손이기 때문에 음보로 약관 17세에 관계에 진출했다. 세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즉 대군시절 가깝게 지낸 사이여서 장래가 자못 화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불의를 참지 못하고 평시서(平市署'시장에서 사용하는 자, 말, 저울 따위와 물건값을 검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기관)의 책임자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궁벽한 시골 봉화 도촌리로 은거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은 물론 동서쪽에도 창을 내지 않고 오직 북쪽으로만 문을 내 단종이 유배된 영월을 바라보며 평생 절의를 지키고자 했으니 바로 공북헌(拱北軒)이다. 공수북헌(拱手北軒) 즉 두 손을 마주 잡고 북쪽을 향해 엎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때 회화나무도 한 그루 심었다.
1457년(세조 3) 치악산에서 원호(元昊), 조려(趙旅)와 함께 절의를 지킬 것을 굳게 명세하고 이름을 돌에 새겼으니 후일 사람들은 이 바위에 쓴 글을 두고 치악산제명록(雉嶽山題名錄)이라고 한다. 평생 바깥 나들이를 삼가며 근신하며 살다가 1528년(중종 33) 94세로 돌아가시니 공이 심은 회화나무도 따라 죽었다.
세조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을 기리는 공주 동학사 숙모전(충남 문화재자료 제67호)과 봉화 도계서원에 배향되고 1858년(철종 9) 승정원 좌승지, 고종 때 이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사림에서 공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도계서원(道溪書院)을 세웠고, 1791년(정조 15) 인근 순흥에서 단종 복위운동을 벌이다가 사사된 금성대군과 함께 모의했다가 처형된 부사 이보흠을 배향했더니 놀랍게도 죽었던 회화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금성단의 은행나무가 금성대군이 사사되고 순흥이 폐부(廢府)가 될 때 죽었다가 대군이 복권되고 순흥이 다시 부로 승격되자 되살아난 것과 같았다.
이 신이(神異)하고 충절이 깃든 나무가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니 공조판서 이원조를 비롯해 110여 명의 선비들이 원근에서 찾아와 공의 충절과 나무의 영험함을 기리는 시문을 지으니 이를 모아 만든 책이 '괴단광감록'이다.
대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후손 봉성 씨를 통해 영주의 갑선 씨를 소개받아 '도촌선생실기'와 '괴단광감록' 한 질을 받았다. 수목학계의 태두인 홍성천 박사(경북대 명예교수)를 만나 이런 나무가 있어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마침 봉화 갈 일이 있는데 동행하자고 했다.
휴가계를 제출하고 봉화로 향했다. 갑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곳에 가는 중이라 동행할 수 없어 미안하다며 종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불통이었다.
도계서원은 국도변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나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이장(里長)의 말에 의하면 한국전쟁 때도 고사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것은 수령이 6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촌이 21세 때에 심었다고 하니 500여 년을 견뎌온 나무다.
병해충 등으로 외관상 고사한 것같이 보이다가 새롭게 움이 돋는 나무는 전국적으로 많다. 그러나 263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늘의 조화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보호수는 물론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력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큰 인물이 직접 심은 나무인 만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 박사도 동감했다.
만약 수령이 걸림돌이라면 현재 상태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심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가 새 싹이 돋은 것이기 때문이다.
원호'조려같이 비록 생육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함께 치악산에서 제명록을 남기고, 절의를 지켰으니 행의는 다를 바 없는 분이다. 다만 너무 깊은 곳에 은거했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 보전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봉화군은 이 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대구생명의 숲 운영위원(ljw167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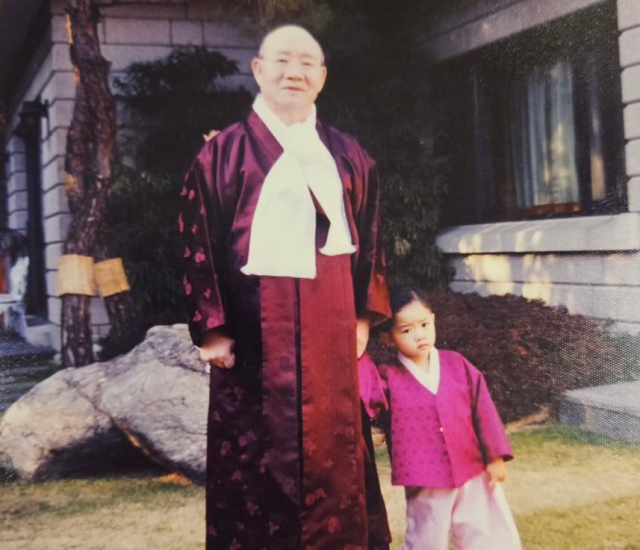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