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이야기하려는 금지곡은 유신 통치 시절에 듣거나 부르기가 금지되었던 곡들이 아니다. 그래서 김민기 '아침이슬' '친구', 한대수 '물 좀 주소', 신중현 '거짓말이야', 밥 딜런 'Blowing in the wind', 비틀즈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퀸 'Bohemian rhapsody'. 또 뭐 있더라, 좌우지간 이런 곡들이 왜 금지곡으로 묶였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종의 우스개처럼 쓰는 속어로써, 금지곡은 좋기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음악을 뜻한다.
사람들이 모인 야외공연장을 갔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흰 플라스틱 의자들은 각 관공서, 예술회관마다 몇 개씩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빌려주는 전문 대여업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거기에 나도 자의로 혹은 타의로 앉게 된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내빈 소개와 축사가 이어진다. 별로 안 지겹다. 이럴 때는 내가 만약 앞에서 연설한다면 어떨지 공부하는 기회도 되니까. 무서운 권태는 그다음에 찾아온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라는 사회자의 소개.
레퍼토리는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테너 가수가 부르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a moment)을 부르면, 소프라노 가수는 '새로운 삶'(A new life)으로 답한다. 적어도 내게 이 곡들은 '지겨운 이 순간'이자 '새롭지 않은 삶'이다. 그 남녀가수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 곡,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부른다. 흰 플라스틱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서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 곡들은 노래방에서 오른 금지곡 목록들-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 김종서 '아름다운 세상', 해바라기 '사랑으로'-만큼이나 끝나는 부분을 반기게 되는 노래다.
무대에 섰던 가수들과 그 작곡자들을 흉보려는 게 아니다. 예술가들이 이겨내야 하는 창작과 수련의 고통을 모른다면 나는 지금 내 직업을 가질 자격도 없다. 다만 그 고난의 열매가 엉뚱한 쟁반에 오른 탓에 제 맛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나는 훌륭한 그림이, 춤이, 노래가,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세워질 때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는 것을 종종 본다. 어떤 예술 감독들과 협력 기획을 하다 보면 한숨이 그냥 나온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비보이 공연팀도 부르고, 청소년 참여 유씨씨 동영상도 제작하입시더." 춤꾼은 밝은 양지가 아닌 후진 골목에서 제 빛을 발하고, UCC는 방에 틀어박혀 누군가의 권위를 조롱하는 맛으로부터 퍼져 나갔다. 문화 행정은 왜 굳이 이런 귤들을 회수(淮水) 건너 탱자로 만들어 버릴까.
윤규홍 갤러리 분도 아트 디렉터 klaatu84@dreamw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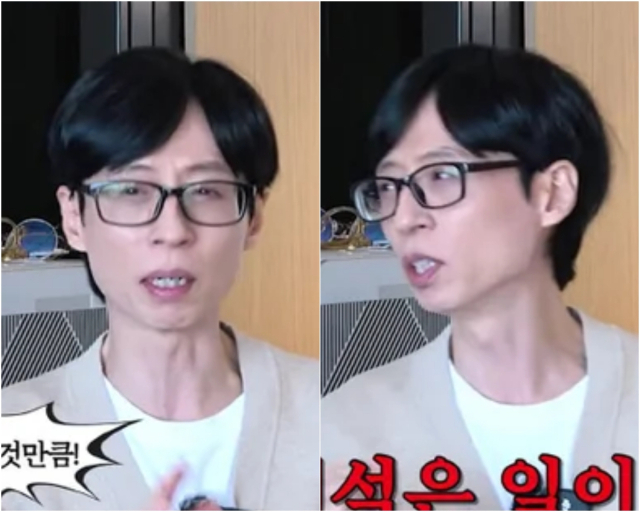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