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껍다'와 '두텁다'는 쉬운 듯하지만 헷갈리는 우리말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권에 들어갈 만한 말이다. '책이 두껍다'와 '우정이 두텁다' 정도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 감각으로 충분히 구분해 낼 수 있다. 그런데 '봉투가 두껍다'의 경우에는 '두껍다' 대신에 '두툼하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발음이 비슷한 '두텁다'를 써야 할 것 같아 헷갈리는 사람이 더러 있다. 여기에서 '선수층이 두껍다/두텁다'나 '수비벽이 두껍다/두텁다'를 물어 보면 '두껍다'가 맞지만 '두텁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사전에 보면 '두껍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두께가 보통보다 크다'이고,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이다. 이 둘만 가지고 보면 '두껍다'는 물질적, 구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텁다'는 추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매우 쉽다. 앞의 예에서 '책이 두텁다'거나 '우정이 두껍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수층'이나 '수비벽'처럼 구체성을 지니는 말이 의미가 확장되어 추상성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확장되어서 추상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말이 아닌 원래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전에는 '두껍다'의 두 번째 의미를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보다 크다'로 명시하고 있다.
'두껍다'와 '두텁다'가 헷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말이 모두 한자로는 후(厚) 자를 쓴다는 점이다. 후(厚)는 일반적으로 '두터울 후'라고 읽고 후덕(厚德: 덕이 두터움)과 후생(厚生: 살림을 넉넉하게 함)과 같이 쓰인다. 그렇지만 후안무치(厚顔無恥: 얼굴이 두껍고 수치를 모름), 후견(厚絹: 두꺼운 명주)과 같이 '두껍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더해주고 넉넉하게 해줄 때는 한자를 그대로 써서 '후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지난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말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랫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대하고, 윗사람들에게는 박하게 대한다는 것으로 더 걷어야 될 것이 있으면 윗사람한테만 거둔다거나 윗사람이 많이 받는 것을 떼어서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공무원연금을 깎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다. 현재 30, 40대 공무원들은 이미 두 번의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한 선배들에 비해 더 많이 내고도 더 적게 받는다. 거기에다 조삼모사(朝三暮四) 하던 것을 조이모삼(朝二暮三) 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금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보통보다 크다' '넉넉하다'고 할 정도로 줄 자신이 없다면 '하후상박'이라는 말장난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능인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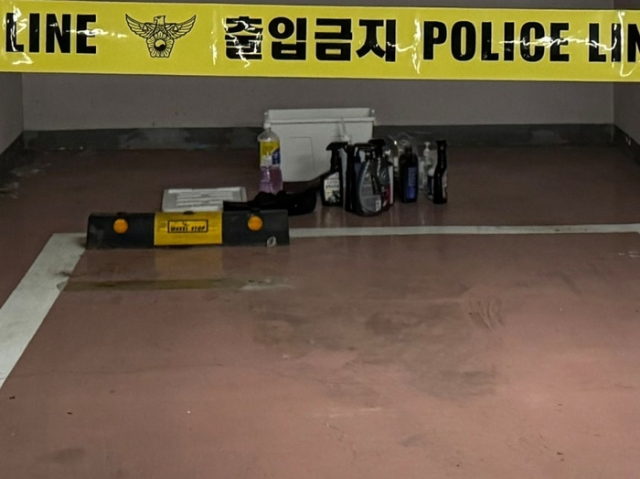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