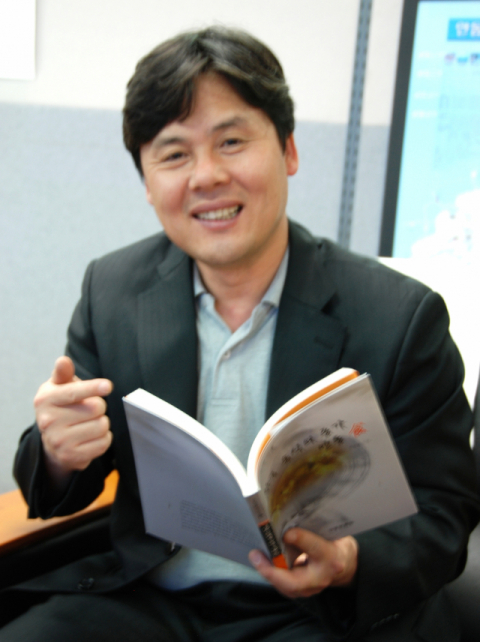
'안동지역이 가마터로 유명했다'는 옛 문헌을 근거로 잃어버린 붉은 흙의 얘기를 품은 '도산서원 가마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안동지역 역사 문헌을 오래도록 연구해오고 있는 최성달(57) 작가는 "안동지역이 도자기 가마터로 유명했던 지역이라 하면 모두들 생소해 한다"며 "하지만, 안동지역에는 도자기 원료인 붉은 흙과 관련된 문헌과 흔적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안동농협이 들어선 자리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사발공장이 있었고, 지금도 5만평 터에 굴뚝이 남아 있는 풍산 삼만벽돌공장은 이 방면에서 아시아 1위 기업이었다"고 한다.
안동이 사발과 벽돌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들어서고 도자기 가마터로 유명한데는 태생적으로 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퇴계와 육사의 땅인 도산 '단천'(丹川)의 단이 '붉은 단'이고, 도자기와 옹기·벽돌 만드는 붉은 쪼대 흙이 이 지역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주장이다.
최 작가는 "낙동강 상류인 단천에서 시작해 왕모산성이 있는 내살미와 육사문학관을 지나 단호, 단촌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은 지금도 비가 오면 붉은 흙이 강을 타고 흘러가는 붉은 흙 벨트"라 주장한다.
'도산'(陶山)이라는 지명도 이 붉은 흙의 산물이라느 것이다. 퇴계 이황선생이 쓴 '도산기'에는 "산중에 오래전부터 옹기 굽는 가마가 있어 도산"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도산잡영'에서도 "순임금이 몸소 질그릇을 구우시니 즐겁고 편안했다"라며 순임금의 도자기 애호를 소개하고 있다.
최성달 작가는 "퇴계는 흙이 불을 온전히 받아들여 질그릇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철학에 이입해 스스로 호를 '퇴도'(退陶), '도수'(陶叟)라고 했다"며 "이는 '도야'陶冶(훌륭한 인물 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음)의 관점에서 삶 전체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라 덧 붙인다.

이처럼 붉은 흙의 내력은 안동의 전탑(구운 벽돌)역사와도 정확하게 맥이 닿아 있다고 한다. 전탑이 유독 안동에 집중 분포돼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 붉은 흙 때문이라는 것이 최 작가의 주장이다.
최 작가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탑과 전탑지가 10곳에 불과한데 그중 국보 16호인 신세동 7층 전탑을 비롯한 4곳과 금계리, 옥산사, 개목사, 임하사의 전탑지 4곳이 모두 안동에 있다는 것은 붉은 흙의 진화와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 한다.
그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도외시됐던 전탑이 안동에서 유행한 것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 구하기 쉬운 붉은 흙이 당시 당의 선진기술 유입으로 산업화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해석한다.
최성달 작가는 "안동에는 남후 광음리와 풍산읍 신양리 분청사기 가마터를 비롯해 18개의 가마터가 남아 있는데 상징적 의미로 먼저 붉은 흙의 전설을 품고 있는 도산서원 가마터를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
최 작가는 "3대문화권 사업이 완성돼 가고 있는 월천서당 인근에 도예가들의 도예마을, 도자기박물관, 도자기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잃어버린 붉은 흙의 전설을 회복할 수 있으르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한다.
한편, 최성달 작가는 안동시청 역사기록관을 엮임하고 퇴계 선생의 유산기를 글로쓴 '사람의 길을 가다', 안동의 역사를 다큐멘터리화한 '네개의 심장' 등 18권의 책을 출간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