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희 신문국 부국장
20년 전, 제1회 언론재단 해외 단기 연수 기자로 뽑혀 일본을 방문했다. 김대중 정부 막바지 시절 한일 문화교류가 무르익을 때쯤이라 일본시찰단 성격이 강했다. 선발된 8명의 기자가 도쿄·오사카·고베 등 일본 전역을 돌며 정관계 인사·언론인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외국어 시험 등 빡빡한 경쟁을 운 좋게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한국 언론을 대표해 일본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부담되고 긴장도 했다.
공식적인 한일 언론 간 첫 교류였던 터라 가는 곳마다 현지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경험이 꽤 낯설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유독 내게 관심이 많았다. '매일신문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과 사명이 비슷해서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희생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원거리 샷'으로 참사 현장을 보도한 일본 언론과 비교하며 "왜 한국 언론은 희생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등 재난 보도를 자극적으로 하느냐".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비스듬한 시선으로 질책하듯 질문하던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대형 참사를 다루는 우리 언론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SNS 등 1인 미디어까지 가세해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사상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신체와 얼굴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그중에는 몸 일부를 드러낸 채 누워 있는 희생자들의 모습도, 여성 희생자가 길가에 쓰러진 채 심폐소생술을 받는 모습도 있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도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멀뚱멀뚱 서서 촬영하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아니나 다를까. 참사 원인이 가스 누출, 화재, 마약 등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합세했다. 희생자들의 모습을 전시하듯 한 사진·영상과 가짜 뉴스를 접한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나라 구한 영웅이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의 막말까지 가세해 유가족의 마음을 또 찢어 놓고 있다. 정치권의 막말이 하루 이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참사 앞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 트라우마가 된 건 온 국민이 침몰 현장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영향이 크지만, 참사 이후 시작된 막말·가짜 뉴스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참사만큼은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온갖 음모론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겼던 세월호 참사처럼 흘러가선 안 된다.
대다수 국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내 아이, 가족의 일 같아서 함께 발을 동동 굴렀고 울었다.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말과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선정·자극적 보도, 이어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정치인의 막말….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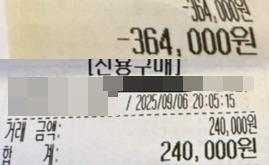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못간다…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
李 대통령 지지율 70% 육박…'여론조사꽃' 조사결과
'700조 선물 외교'에도 뒤통수 친 미국, 혈맹 맞나
대통령실 결단에 달린 'TK신공항 자금난'…대구시 '新 자금 계획' 예고
트럼프 "한국 배터리·조선 인력 불러들여 미국인 훈련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