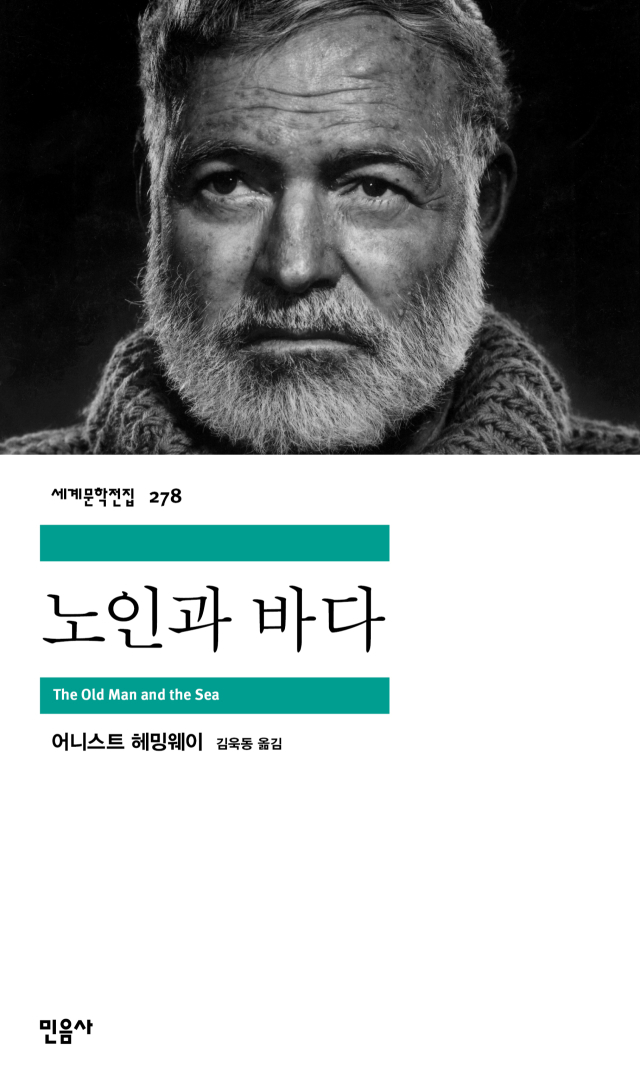

노인(산티아고)은 먼바다에 나가 3일간의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다. 배보다 더 큰 고기를 배에 달고 집으로 돌아온다. 피 냄새를 따라온 상어 떼가 청새치를 모조리 뜯어먹는다. 노인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고기는 하얀 뼈와 빳빳한 꼬리만 남는다. 그게 부둣가에 매어둔 배 옆에서 파도를 따라 출렁인다. 마침 그걸 본 한 외국 관광객이 저게 뭐냐고 묻는다. 옆에 있던 웨이터가 기다렸다는 듯 반응한다. 그는 청새치라고 답하는 대신 상어가 저렇게 했다며 그 내막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게 그 여자 관광객이 말한다. "상어가 저리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양의 꼬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말한다. "나도 그래."
이게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대사다. 청새치의 뼈대와 꼬리가 상어의 것으로 오인되어 경탄을 자아내는 데서 서사가 끝난다. 노인과 고기의 장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려던 웨이터의 열의는 무시된다. 구경하며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청새치와 상어를 구별하는 것도 큰 관심사는 아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본 것으로 족하다. 그것은 앙상한 뼈대로 인해 부각된 아름다움이다. 거기에 얽힌 노인의 열정과 무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이 지점에서 미(美)에 대한 두 가지 고전적인 입장을 추려볼 수 있다. 칸트식의 형식미와 헤겔식의 내용미가 그것이다. 전자는 이해관계나 목적의식 없는 형식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입장이다. 우연히 본 고기의 뼈와 꼬리에서 즉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 관광객의 경우다. 그 이면에 어떤 우여곡절이 내포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걸 알면 아름다움은 오히려 반감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아름다움은 정신이나 이념이 감각적으로 드러난 것이기에 감동을 준다는 견해가 내용미학이다. 청새치의 뼈와 꼬리가 아름답다면 그것은 노인의 강인한 정신이 현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간의 사연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웨이터가 관광객의 단답식 질문에 긴 내용을 이야기하려 한 이유다. 그렇다면 헤밍웨이는 어느 쪽일까? 웨이터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형식미 쪽이 아닐까? 노인이 빼앗긴 청새치의 살을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점도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다. 뼈와 꼬리만으로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논지를 헤밍웨이의 글쓰기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헤밍웨이는 짧고 명료하고 수식 없는 건조체로 유명하다. 이것을 하드보일드(hard-boiled) 문체라고 한다. 그가 받은 노벨상은 이 문체 덕분이라는 말이 있다. 뼈대와 꼬리만 남은 청새치의 미는 헤밍웨이의 글쓰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떼어낼 것 다 떼내고도 아름다울 때, 그것이 진짜 문장이라는 것. 글의 뼈대에 붙이는 살이 아니라 뼈대 자체가 문체여야 한다는 것. 헤밍웨이는 중복을 지우고 형용사를 추려내고 자아를 빼는데 혼신을 다한 작가다. 끝없는 고쳐 쓰기(rewriting)를 했다. '노인과 바다'는 200번 고쳐 썼다고 한다. 명문을 꿈꾸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가, 미션 임파서블인가.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