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정년 65세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자 재계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정책 속도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25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착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청년 고용 여건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세 단계로 제도를 안착시켰다. 2000~2005년은 '65세 고용연장 노력 기간', 2006~2012년은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 2013~2025년은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으로 나눠 시행했다. 이처럼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일본은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기업별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60세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 재계약 형태로 근로를 이어가는 '계속고용 제도'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 유지나 임금 삭감에 대한 별도 규제도 두지 않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일자리 사정도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나았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신규 구인배수는 2.28개로 구직자 한 명당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었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0.58개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 수요가 충분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미 청년 일자리 부족이 구조화돼 있어, 급격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사 합의를 통한 선별적·단계적 고용 연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역시 "정년 연장은 기존 노사정 중심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 같은 보완책 없이 '연내 입법'만 목표로 밀어붙일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년이 5년 연장되면 수만 명의 고령 근로자가 회사에 남게 된다. 임금보다도 공간과 인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제도 도입의 속도보다 현장의 수용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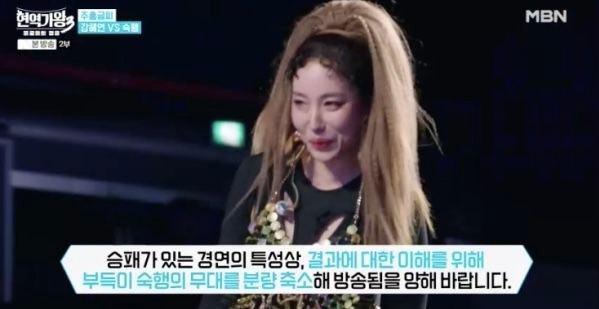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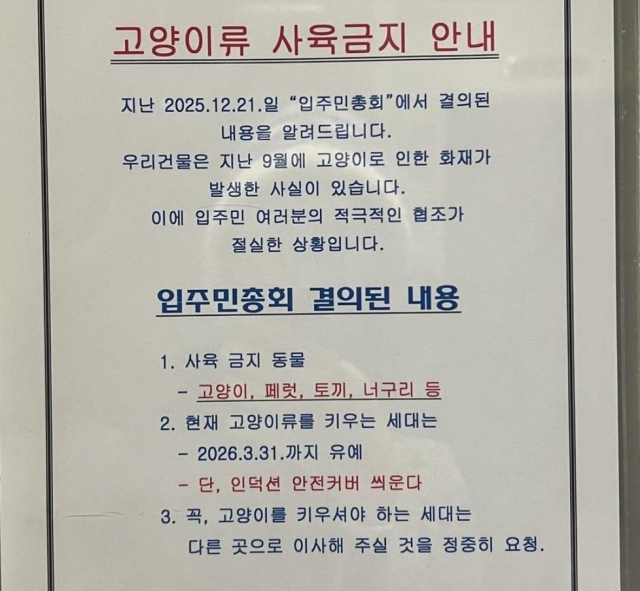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李대통령 "이제 중국 미세먼지 걱정 거의 안 해…엄청난 발전"
[단독] 정부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
무안공항→김대중공항... "우상화 멈춰야"
한중 정상, 한반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