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 한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서 비롯된 말이다.
왕십이(王十二)란 사람이 자신의 불우함을 토로하는 시를 보내자 이백은 '찬 밤에 홀로 술잔을 들며 수심에 잠긴다'는 답시로 그를 위로했다.
이 시에서 "세상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시부(詩賦)를 들으려 하지 않음이 마치 봄바람이 말의 귀에 부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부박(浮薄)한 세상 인심을 비꼬았다.
▲마이동풍과 좀 엇나가지만 우리 옛 어른들이 흔히 쓰던 "번쾌(樊口會) 같다"는 말도 중국의 한 인물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번쾌는 중국 한 고조 유방의 으뜸장수다.
항우가 함양에서 칼춤으로 유방을 모살하려 들자 이를 막아준 공로로 후에 정승에까지 올랐다.
사납고 용맹하기가 남달라 어른들이 행동이 요란한 아이들을 보면 번쾌로 비유했다.
▲하지만 번쾌는 용맹하기만 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항우가 유방을 모살하려는 즈음에 유방이 인사도 없이 도망가도 되겠느냐는 문제로 망설였다.
번쾌는 "대행(大行)에는 세근(細謹)을 불고(不顧)한다"는 말로 안절부절 못 하는 유방을 압박했다.
큰일을 할 사람이 자잘한 일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방은 이 말을 좇아 병사 4명만 데리고 달아났다.
▲외교부가 청사 1층에 걸린 20여 마리의 말 그림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방향이 제각각인 말 그림이 외교부의 기를 흩어 김선일·탈북자 사건과 같은 악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속설(?) 때문이다.
국민들의 질타가 장기간 계속되자 반기문 장관은 공직생활 35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그림을 갖다 놨어야 했다"는 푸념을 털어놨다.
▲장관이 얼마나 답답했기에 그런 말까지 했을까. 국민들 또한 굿판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개혁을 한다는데 개혁의 그림이 없고, 수도를 옮긴다는 데 수도의 그림이 없다.
경제를 살리자는 그림 제목은 있으나 액자 속은 텅 비어 있다.
미망(迷妄)의 공간을 헤매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세상여론에 마이동풍이며, 대행에 세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외교부가 아니라 나라의 말 그림을 바꿔야할 판이다.
박진용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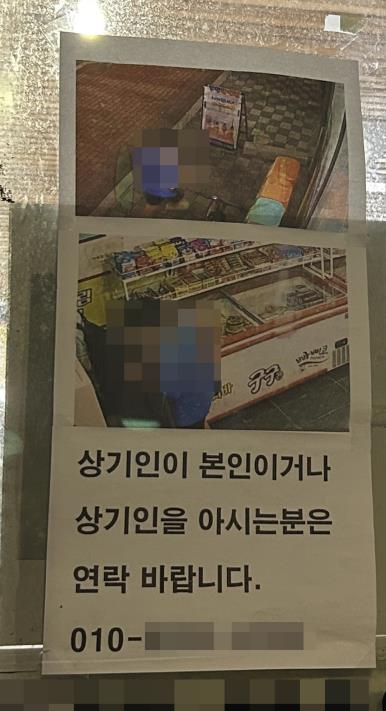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