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다. 늙은 노동자의 얼굴처럼 깊은 주름이 잡혀 있는 목이 긴 가죽구두로, 끈이 풀어져 내려와 있고 왼쪽 신발은 발목이 접혀있다. 여기저기 가죽이 터지고 징이 박힌 바닥이 드러나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86년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이 낡은 구두들은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인 구두가 됐다. 흔히 습작 정도로 여기는 이 구두가 세상에 나온 지 50년이 지난 후, 하이데거가 자신의 예술철학을 논증하기 위해 반 고흐의 구두그림을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구두그림은 단숨에 인문학의 화두로 뛰어 올랐다.
'빈센트의 구두'는 고흐, 벨라스케스, 마티스, 쉬베 등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 데리다의 철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회화를 즐겨 인용하는 것은 그림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의무감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자율성 때문이다. 화가에게는 모든 판단의 의무에서 해방돼 사물을 순수하게 바라볼 권리가 주어진다.
이 책은 그림과 철학의 만남 중 후기 구조주의 철학의 대표격인 푸코와 데리다, 그리고 실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반 고흐의 구두그림을 예로 들었다. 착용자의 고단한 삶과 노동이 각인되어 있는 찌그러지고 망가진 낡은 구두를 통해 그는 예술작품이 단순한 제품적 성격을 넘어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 준다는 것을 해명했다. 그는 또 예술작품이란 존재의 진실로 껑충 뛰어오르기 위한 스프링 또는 발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구두 그림일까? 그리고 반 고흐는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구두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구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구두는 그 구두를 신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가장 인간화된 사물이다. 발 모양을 닮은, 깊게 주름진 구두는 그대로 내 삶의 은유이자 환유이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두와 인문학의 관계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착용자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제품인 구두는 그림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된다. 마그리트의 '빨간 모델', 미로의 '낡은 구두가 있는 정물화', 린드너의 '구두' 등의 작품은 구두를 묘사하고 있지만 각기 팝아트, 초현실주의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구두는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선 무의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됐다. 그 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신발을 성적으로 연관시킨다. 그 상징적 의미는 옛날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데 신데렐라가 바로 그것이다. 거의 모든 민족이 이와 유사한 옛날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유독 신데렐라가 매혹적인 것은 투명하고 깨지기 쉽고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유리구두의 기발한 이미지 때문이다. 신발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미끄러져 들어가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감싸지는 작은 용기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무도회의 끝 무렵, 왕자가 신데렐라를 잡으려 하는 순간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다는 설정은 그것이 처녀성의 이미지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상기시킨다.
'빈센트의 구두'는 그림 이야기와 함께 영화분석도 함께 싣고 있다. 영화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고 영화를 통해 데리다의 철학을 읽어낸다.
이 책은 현대적 미의 밑바닥에 깔린 철학적 근거들을 네 사람의 서양철학자들의 미학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현대적 아름다움인가'하는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철학적 깊이를 지켜나가면서도 주제에 대해 쉽고 뚜렷한 접근을 하고 있어, 난해하고 고루한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인문서에 신선한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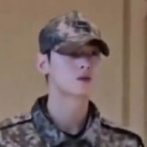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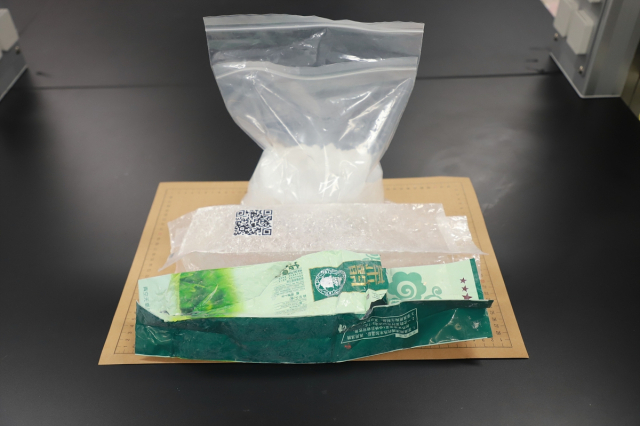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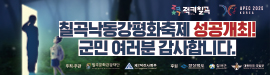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