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 가지로 선 나무들
눈을 안았다.
폭설의 밤이 지나고
개벽천지
검은 산은 흰 눈의 아침을 맞았다.
인적 없는 산사는
처녀의 눈길을 가리마처럼 드리우고
절벽 밑의 곡수(谷水)는
굽이진 흐름을 멈추고 분지를 넘본다.
안온하다고 붙여진 절 이름, 안일사
견훤에 패주하던 왕건의 꿈을 기억하고 있을까.
장군이 앉아 큰 숨을 몰아쉬었다고 골 이름마저 안지랭이다.
상처난 걸음으로 긴 칼 끌고 찾은 날
겨울새도 날갯짓을 쉬었다.
눈꽃에 숨긴 적송의 붉은 속살만이
갑옷 속 군왕의 피처럼 끓고 있다.
글:김중기기자
그림:조규석(서양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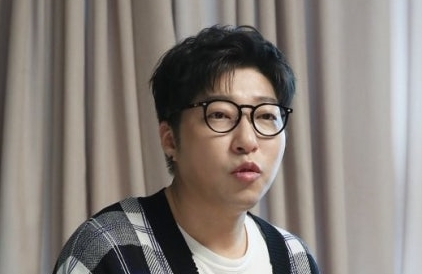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박지원 "김정은, 두번 불러도 안 보더라…우원식과 악수는 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