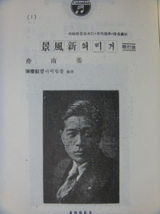
가수 강남주의 대표곡은 누가 뭐래도 '울고 싶은 마음'이며 해방 후 그가 가수활동을 접은 다음 후배가수 최갑석이 다시 불러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제 말 그의 전체 활동 시기는 1939년 5월부터 1941년 6월까지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데뷔곡 '울고 싶은 마음'을 비롯해서 마지막 곡 '항구의 물망초'에 이르기까지 도합 13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거리의 신풍경'이란 흥미로운 가요곡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편에 가는 아가씨 좀 봐 주걱턱 납작코
절름발이 꼴불견 그래 봬도 몸맵시만은 멋쟁이다
하하하 사랑을 찾아서 헤맨다
-'거리의 신풍경' 1절
얼핏 봐도 대단히 위험천만한 가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 외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됩니다. 주걱턱, 납작코, 절름발이, 조리상, 들창코, 말상, 주먹코, 안짱다리, 덧니박이 등 민감한 외모를 이렇게 '꼴불견'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엮어가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함마저 느껴집니다. 예나 제나 작사가, 작곡가들의 대다수가 남성들의 독점이자 전유물이었으므로 가부장적 관점의 여성편견, 여성비하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가사 중 '하하하'란 대목에서는 뭇 남성들의 조롱과 멸시의 낌새조차 발견됩니다. 바람둥이 남성의 전후좌우를 휘젓고 다니는 그 적극적 포즈의 여성들은 다름 아닌 모던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던(modern)이란 말 속에는 식민지적 근대의 낯설고 도발적인 풍속을 몸으로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에 대한 강한 풍자와 비판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청년남녀를 통칭해서 당시 언론에서는 '모뽀모걸'이란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양식 외모를 즐기는 당시 청년남녀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현실의식이나 역사의식의 분별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요. 태양을 뒤쫓는 해바라기처럼 식민지적 근대문화를 오로지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려는 자세만 나타내보였을 뿐입니다.
가수 강남주가 1941년 두 해 만에 가수활동을 접은 까닭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험한 세월에 활동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항도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부산의 가요연구가 김종욱의 증언에 의하면 강남주는 1914년 황해도 봉산 출생이라고 합니다. 1955년 부산에서 '여인 탑'이란 노래의 취입음반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더 이상 가수활동은 하지 않았고, 작곡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 후반, 부산진(釜山鎭) 성곽이 보이는 자성대 언저리에 음악학원을 열고 작사 작곡을 겸하며 '강남주작곡집'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역시 황해도 박연 출생으로 부산에 살고 있던 동향의 작사가 야인초(野人草'본명 김봉철)와 친밀하게 어울리며 음반활동을 기획하고 제자들도 양성했던바 가수 진송남, 작곡가 남국인 등은 이때 배출된 그의 제자들입니다.
'강남주작편곡집'은 LP음반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도토리자매 가요특집으로 기획되었고 오메가음반공사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에는 '애사(哀詞)의 노래' '여인심정' '울고 싶은 인생선' 등 12곡의 작품을 실었습니다. 강남주는 1976년 부산에서 62세로 사망했습니다.
일제 말 암흑기에 가수로 데뷔해서 해방 이후 새로운 활동으로 변신했던 사례로는 진방남(반야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가수에서 작사가로 전업했지만 강남주는 가수에서 작곡가로 바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