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때 등장한 단두대(기요틴)는 역설적이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목을 베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인도주의'의 산물이었다. 당시 공개 처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형수가 서민일 경우 이런 방법이 사용됐지만, 귀족도 반드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영국 왕 찰스 2세의 사생아로, 숙부인 제임스 2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킨 제1대 몬머스 공작 제임스 스콧의 참혹한 죽음이다. 스콧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공식 기록으로는 목에 모두 5번의 도끼질(7번이란 설도 있다)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의 목은 좀체 잘리지 않았다. 결국 사형집행인은 고기 써는 칼로 마지막 힘줄과 살점을 잘라내야 했다.
잉글랜드 왕위를 놓고 엘리자베스 1세와 경쟁하다 패한 메리 스튜어트도 세 번의 도끼질 끝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끝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머리 뒤편에 박혔고, 두 번째는 어깨로 떨어졌다. 세 번째는 성공했지만 사형집행은 완료되지 못했다. 연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결방법은 스콧의 경우와 똑같았다.
이러한 끔찍한 처형은 집행인이 유난히 가학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단순히 서툰 솜씨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사형수로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처형 직전 단번에 끝내달라며 망나니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스콧도 거금을 주었지만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처형의 끔찍함은 이를 지켜보는 대중은 물론이고 사형집행인에게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던 것 같다. 스콧의 사형집행인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울음을 터뜨리며 "나는 못하겠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는 런던탑(처형장이었다)에 전시되어 있는 사형집행용 칼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신의 도구일 따름이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중앙대 재단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협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근대 이전의 야만적 처형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막말은 우리 재벌의 황폐한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박 이사장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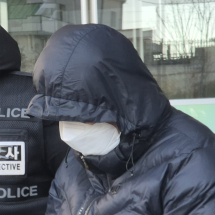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서명수 칼럼] 소통과 호통,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언행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