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에게는 누구나 부르고, 또 불러도 자꾸만 부르고 싶은 단어가 있다. 바로 '엄마'라는 두 글자이다. 나에게 있어 우리 어머니는 좀 특별한 분이시다. 4남매를 낳아 나 하나를 건지신 어머니는 고희가 된 나를 아직도 슬하의 아기로 여기신다. 그런 모성애를 헤아리며 나는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서 스스로 아기로 존재하며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
1920년생 노모의 주름에 미소를 번지게 할 확실한 길을 닦아 놓고, 매일 그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엄마의 자리'이다. 엄마의 자리에서는 나는 어김없이 꼬마로 돌아가서 출필곡반필면(出必告反必面: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뵌다는 뜻)한다. 그중에서 반필면을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른 날이 없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실천했다기보다 어머니가 친 그물망에 내가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민물고기의 습관을 이용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비스듬히 그물로 막고 그 끝에 통발을 설치하면 쉽게 고기를 잡는다. 어머니는 '엄마의 자리'라는 그물을 쳐놓고 집에 돌아오는 나를 기다리신다.
보통 때 '엄마의 자리'는 어머니의 방이지만, 일 년에 한두 번은 그 자리가 대문 밖일 때가 있다. 내가 집에 돌아올 시각이 지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애비 와 아직도 안 오노?' 하고 아내에게 묻는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융통성을 발휘해 모임이나 직장일로 늦는다고 말하면 방에서 기다리신다. 그런데 부부갈등이 있는 날은 아내의 융통성은 저기압에 갇혀 '나도 모른다'고 말해버린다. 말을 하지 않고 대문을 나선 내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날 '엄마의 자리'는 대문 밖이 된다. 그래서 아내의 맘이 편치 않을 때는 직접 어머니에게 늦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고 출필곡한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엄마의 자리'가 대문 밖일 때도 있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실버탁구시합을 마칠 때쯤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집에 전화를 하니 받는 이가 없었다. 그제야 아내가 모임에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의 방이 전화기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벨소리가 울려도 전화 받을 생각을 애당초 안 하신다. 귀가 어두워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청기를 해드렸지만 윙윙거리는 소리가 싫다며 벗어던져 버렸다. 어찌 되었던 통화가 안 되니 불안해 저녁을 먹자는 친구를 뿌리치고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추위에 떨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 아파오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
나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덥석 안았다. '엄마'라는 촉촉한 울림에서 묻어난 정과 사랑, 은혜와 불효가 한데 어우러져 눈물로 한없이 쏟아졌다. 환갑 때 업고 춤을 추었을 땐 무거워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 그날의 엄마 무게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세월이 앗아간 엄마의 무게를 뒤늦게 감지한 순간 무심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엄마, 엄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우는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모셨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엄마라는 말이 듣고 싶어 백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엄마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나의 반필면을 기다리신다. 반필면 때 어머니는 꼭 선물을 마련하신다. 경로당에서 주는 간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내 몫으로 주머니 깊이 갈무리하신다. 때로는 가루가 된 초코파이도 있고, 꼭 쥔 손의 온기로 녹아서 단물이 흐르는 사탕도 있다. 특히 나를 생각하며 만지작거려 손때가 묻고 멍이 든 토마토 같은 과일은 먹기에 꺼림칙하지만 달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야 어머니가 소녀처럼 환히 웃으시기 때문이다. 깊은 주름을 타고 온 얼굴로 퍼지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도 나는 싫어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다.
'엄마의 자리'에서 나는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된다. 어머니의 얼굴에 내린 그늘의 두께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다. 수심이 얕으면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점쟁이처럼 처방한다.
"엄마, 오늘은 돈 잃었구먼."
"110원이나 잃었는데 니 우째 아노?"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며 천 원짜리 한 장을 슬그머니 빼주면 엄마는 명품 설빔을 받은 소녀처럼 금방 환하게 웃으신다. 노인들은 꽃 맞추기 민화투를 치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원을 준단다. 운이 없는 날은 100원 넘게 잃을 때가 있는데 나는 말하지 않아도 용케 알고 잔돈을 빼준다. 그런 날이 잦아지면서 아내는 투덜거린다. 손자와 내가 드린 용돈은 어디에다 다 쓰고 화투에서 잃은 돈을 채워주길 바라는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머니가 저기압일 때는 더 강한 처방으로 선수를 치는 게 상수다.
"엄마, 내일 모임인데 용돈이 떨어져 어떡하지. 마누라한테 달라면 바가지를 긁을 텐데…."
일부러 머리를 긁적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본다. 어머니는 농에서 만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면서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며느리가 알면 가정 분란이 일어나니 비밀이란 뜻이다.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서 아들을 건져준 어머니는 어느새 승자의 자세로 늠름해진다.
어머니 기분 상태가 아주 심각하면 나는 종아리를 걷어 보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느새 종아리를 때리던 옛날로 돌아가 먼지를 뒤집어쓴 추억을 반추한다.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내 어린 시절을 퍼내고 또 퍼내도 샘솟는 샘물만큼이나 추억거리가 많다. 여름이면 친구들은 시장에서 산 반바지를 입는데 나는 늘 엄마가 만들어준 삼베 잠방이만 입었다. 나도 반바지를 사 달러니까 삼베 잠방이가 떨어지면 사준다며 픽 웃으셨다.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삼베 잠방이는 아무리 입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반바지가 너무 입고 싶어 마음이 급한 나는 냇가에서 목욕하며 바위에 삼베옷을 문질렀다. 엄마는 왜 삼베옷이 떨어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기운 옷을 내밀며 학교에 갈 때 입고 가란다. 기운 삼베 잠방이도 창피한데 거기에다 종아리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정말 학교에 가기 싫었다.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려야 다시 나쁜 짓 안 한다는 어머니의 철학은 용서가 없었다. 나는 부끄러워 책보자기로 기운 곳을 가리고 학교로 갔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니 새 반바지가 책상 위에 있었다. 그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동심의 창고에서 꺼낸 추억을 새김질하다 보면 신이 난 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더니 서운함이 도를 넘으면 '엄마의 자리'에서 눈물을 찔끔거리실 때가 있다. 섭섭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딸이 없어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럴 땐 나는 딸이 되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다에 가자고 한다. 한번은 자갈치시장에서 회를 먹는데 유심히 지켜보던 주인이 회를 듬뿍 더 주었다. 머리가 허연 내가 '엄마'라고 부르니 이상했고, 어머니는 회는 안 먹고 따라 나온 반찬만 드셨다. 그런 어머니 앞에 나는 회를 덜어 드리고, 어머니는 속이 안 받는다며 내게 다시 갖다 놓았다. 어머니의 모성애와 병든 어미 까마귀 섬기듯 꼴랑 내 효심의 어울림을 보고 적선을 한 것이다. 어머니는 어느 날 다시 바다에 가자니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얼마 남지 않은 생일날 손자 손녀들도 함께 가자고 했다. 손자 손녀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두었는데 생일날 돌려준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내가 드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며 2천만원이 든 통장을 주셨다. 내게 그렇게 준 것처럼 손자 손녀들에게 베풀고 싶었던 것이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신 어머니의 말에 콧등이 시큰해왔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자리'에 앉았다.
"신이시여!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런 나의 기도가 효험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수필 부문 우수상
서로석(71) 씨
전 초등학교 교장
현 대봉도서관 동화 창작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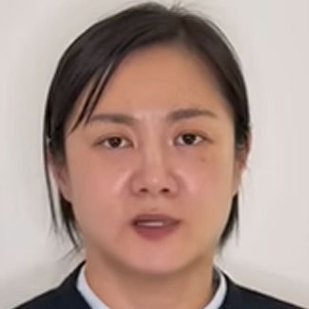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