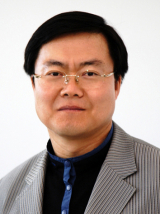
17세기 중후반 조선의 정국을 주도했던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은 숙명의 정적(政敵)이었다. 노론의 영수와 남인의 대표였던 두 사람은 성리학적 이념 논쟁인 이른바 예송(禮訟)으로 권력투쟁을 벌이던 견원지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암은 중병이 들어 백약이 무용인 지경에 이르렀는데, 뜻밖에도 미수에게 처방을 구한 것이다. 그러자 비상을 넣은 극약처방이 나왔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암이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고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의 요체는 사활을 건 당쟁 속에서도 인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미수와 우암의 담대한 풍모와 도량이다. 아무튼 한방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극약으로 병을 다스리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 같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처방은 그 철학적인 이치를 음양(陰陽)의 순환 법칙에서 찾는다.
양이 극하면 음이요, 음이 극하면 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의 상통 원리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내공을 갖춘 고수의 영역으로, 난치병에 가끔 꺼내 드는 비방일 뿐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화염 속 같은 날씨만큼이나 극단적이다.
다른 무리나 다른 것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통합과 상생으로 이루어내야 할 공동체 의식은 공염불이 되었다. 승자 독식의 논공행상만 있을 뿐이다.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노골적인 편 가르기와 분열 책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일이다.
조선시대에도 당쟁의 폐해가 극심했다. 송시열과 동시대 학자였던 박세채는 탕평론에서 정치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是非)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비론(是非論)보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를 가리는 우열론(優劣論)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정조시대 탕평 정치의 이념이 되었다
후한서(後漢書)에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나온다. 잘잘못에 관계없이 자기와 같은 무리끼리는 한데 뭉쳐 서로 돕고, 반대자를 무조건 배격하고 공격하는 것을 이른다.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고 우리 사회의 세태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는 '선악(善惡) 이분법'의 안경을 쓴 인사들이 곳곳에서 완장을 차고 있다. 그들은 선한 자신이 악한 상대를 타도해야 한다는 운동권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치는 척결이지 협치가 아니다. 그러니 보수궤멸론과 함께 장기집권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이 핍박을 받던 시절 공감하고 동조했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던 슬로건도 잊은 듯하다. 극우 독재나 극좌 독재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이비 보수'도 문제이지만 '싸가지 진보'도 문제이다. 좌와 우는 보완재가 되어야지 일방이 일방을 쓸어버리는 적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기와 생각과 노선이 달라도 함께 어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 학자 조너선 색스는 '차이의 존중'이란 책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요,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이든 사회의 조직이든 건강할수록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거칠고 경직되기 마련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어느 정치인이 말했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