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즐겨찾는 길들은 계절을 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트레킹 가이드 북에서는 계절별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곤 한다. 하지만 이 계절에 이쁘고 저 계절에 미운 길이 어디 있으랴. 길이 있으니 걷고, 또 걸어서 행복할 뿐이니 그것으로 족할 따름이다.
'오대산 선재길'이 바로 그렇다. 특히 코스의 초입에 천년고찰 월정사가 자리하고 있고, 코스의 마지막도 절(상원사)이니 다른 길보다 쉼과 볼거리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뜻하지 않게 우리 역사의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다.

◆ 일주문에서 천년의 숲으로 '풍덩'
월정사 일주문 앞에서 섰다.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이라고 쓰여진 탄허스님 친필 현판이 우리 일행을 맞이한다. 현판을 머리에 이고 일주문 안쪽으로 한 발 들여 놓아 본다. 그대로 '천년의 숲'이라고 불리는 월정사 전나무 숲, 그 바다로 입수다. 널찍하고 폭신한 황톳길이 다리미로 다려 놓은 듯 평평하게 이어진다.
황토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기운은 발바닥에 '착' 감기며 아스팔트 도로가 전해준 뜨끈한 기운들을 스르륵 삼켜 버린다. 이내 사이다 같은 청량함이 온 몸에 전달된다. 오대산 전나무 숲길의 시작, 오대산 선재길의 시작이다. 그러고 보니 이 전나무 숲길도 '전나무 숲 탐방로'라는 이름의 독립된 둘레길로 조성돼 있다.

9km에 달하는 선재길 코스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2km 남짓한 전나무 숲 탐방로를 한바퀴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아름다움, 놀라움의 순간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월정사 전나무 숲이 광릉 국립수목원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의 전나무 숲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월정사에 가까워 질수록 오대천 물소리는 더 거세게 귓전을 때린다. 이제 월정사 도착이다. 그 초입에 선재길 이정표가 보이는데 상원사까지 9.2㎞ 남았음을 알린다. 표지판이 가르키는 대로 걸으면 월정사 담벼락을 오른편에 끼고 걷는 숲길이 또다시 쭉 이어진다. 하지만 월정사 경내를 둘러보고 가도 선재길 코스에 다시 올라탈 수 있으니 일단 천년고찰 월정사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언덕 쪽으로 발길을 틀어 천왕문을 지나고 금강문을 거치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안에 들어서게 된다. 마당 한가운데 국보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 보이는데 고려 전기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대로 그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답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잠시 쉼을 청해 본다. 탑 앞에서 서서 소망 한자락 마음 속에 품어보고는 다시 구도의 길, 치유의 길, 선재길 위에 오른다

◆선재길 본진에 들다
팔각구층석탑을 오른쪽에 끼고 앞으로 전진. 대강당과 범종루 사이를 통과해 월정사 품에서 벗어난다. 그럼 바로 차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치형 문, 아치형 나무다리를 건너 다시 숲의 품에 안긴다. '깨달음, 치유의 천년 옛길!'이라는 설명이 붙은 오대산 선재길 본진으로 침투한다. 길을 따라 천천히 하늘로 향하는 완만한 경사를 타고 시나브로 오르다 보면 상원사에 쉬이 닿을 수 있다.
이 곳은 1960년대 상원사까지 연결된 찻길(446번 지방도)이 나기 전까지 스님과 불자들이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가던 유일한 길이었다고 한다. 코스의 초입은 평평한 나무 데크길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내 지장암과 상원사로 향하는 갈림길에 도착. 왼쪽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오르면 지장암, 우측 방향으로 폭신한 흙길을 따라가면 상원사다.

얼마를 걸었을까. 금방 너른공터, '회사거리'에 도착.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오대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가공하던 조선총독부의 목재회사가 있어 '회사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회사거리에는 약 360여 가구의 화전민이 마을을 형성해 살았다고 하는데 1960년대 말 화전정리 사업으로 이주하고 지금은 그 흔적만 간직하고 있다. 이후 사찰 불사에 쓸 재목을 제작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됐지만 선재길을 정비하면서 현재는 공터로 남아있다.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서 보관하던 조선왕조 실록, 의궤도 모자라 이 곳의 나무까지 모조리 베어 가려고 회사까지 세운 일제의 뻔뻔한 행태에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반야교를 오른쪽에 두고 다시 한번 차도를 건너 숲 안으로 들어선다. 또다시 나무 데크길이 이어지는데 순간 시원한 바람 한자락이 스친다.
숲 속에 스며든 바람은 녹색의 싱그러운 기운들을 실어 나르고 불쑥 불쑥 튀어오른 바위를 타고 넘어 넘실대는 오대천의 물길과 조우한다. 이처럼 선재길은 숲 길 특유의 고요함과 계곡의 물소리가 전해주는 분주함이 이러구러 교차하며 우리의 걷기에 동행한다.

◆ 오대산 슬픈 역사의 현장과 만나다
화전민 터가 있었음을 알리는 안내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 지나친 회사거리에서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월정사 소유 산림에 대한 채벌권(採伐權)을 얻게 된 일제가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인력을 모집했고 오대산에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마을이 형성된다. 벌목의 특성상 노동자들은 주로 겨울에 동원됐고 일이 없는 봄부터는 산에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오대산에는 '산판(山坂)'과 '화전(火田)'이 혼재한 상당히 독특한 화전민 마을이 만들어졌다. 엄청난 벌목노동의 댓가는 적은 양의 쌀이 고작이었고 살기 위해 숯을 구워 팔기도 했다. 실제 숲길 곳곳에서는 숯가마 흔적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는 눈길이 물길 쪽으로 향한다. 요란한 물소리가 숨을 죽이고 머물렀던 곳, '오대산 보메기'다.
이 숲길의 찬란한 아름다움들을 눈 안에 채 담아두기도 벅찬데 자꾸 역사의 아픈 현장들이 이처럼 눈앞에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보메기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철이나 홍수로 터진 보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지만 이곳 오대산 보메기는 보를 막아 오대천의 물을 모으고 목재를 쌓아 놓은 뒤 많은 비가 내릴 때 보를 터트려 목재를 이동시키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한다.

일제가 나무를 쉽게 옮기기 위해 오대천 물길까지 제 멋대로 막고 터트리기를 반복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 숲 속에는 아직도 목재운반용 철도 레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력이 있는 기차를 운행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힘으로 밀고 끌고 무거운 나무를 옮겼다고 하니 그 고초가 오죽했으랴. 복잡한 머리를 이고 걷다 보니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새 몸은 숲길 한가운데. 또 출연하는 나무 데크길. 그 위를 걷다 다시 폭신한 풀길, 다시 흙길을 번갈아 걷는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바람을 만나 이리 저리 흔들리고 일렁이더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를 반복한다. 빽빽한 나무 사이로 피톤치트가 흘러 넘쳐 유영한다. 그 사이 조릿대의 바다를 건너고 다리를 건너 오대산장 입구에 도착이다. 여기부터 상원사까지는 4km 남짓한 거리다.


월정사부터의 거리만 따지만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온 셈이다. 만화경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은 풍경이 숲 길의 매력이다.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한 껏 즐기다 보니 상원탐방지원센터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월정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지만 넉넉한 시간. 우리는 상원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숲길이 뿜어낸 싱그러운 녹색의 기운은 옛 이야기를 품은 채 그대로 내 뒤를 따른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일보 오석기. 조상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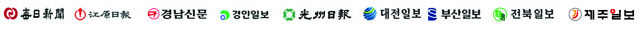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연신 눈물닦았다…李대통령 부부, 고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