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공지능의 격차는 나라별로 얼마나 될까? AI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 AI 에이전트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AI 주권은 또 무슨 말인가? 2016년 이세돌과 바둑을 둔 '딥 마인드'는 어디까지 진화되었을까?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가 울산에 오는 9월에 착공한다는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일까? AI인재는 필요없을까? 어떻게 구해야 하나?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자.
◆AI 의 국가별 격차 기준은
먼저 세계 인공지능의 국가별 격차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가 있는 지를 척도로 삼으면 된다. 2025년 6월 현재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단 32개국에만 존재한다.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세계 최첨단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의 인공지능(AI) 연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미국이 51%, EU가17% 그리고 중국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가장 복잡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데, 전체 국가의 약 16%에 해당하는 32개국만이 이러한 마이크로칩과 컴퓨터로 가득 찬 대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말하는 '컴퓨팅 파워(compute power)'를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AI 작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는 AI 컴퓨팅 허브가 거의 없으며, 인도는 최소 5개, 일본은 최소 4개의 AI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150개국 이상은 단 한 곳도 없다.
◆AI 데이터센터 한국과 각 국 상황은
한국은 몇 개가 있을까? '0'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가 2029년 2월까지 103 M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 Naver, Kakao, Alibaba 등 대기업과 글로벌 CSP도 하이퍼스케일급 설비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다.
참고로 아마존이 인디애나주 뉴칼라일(New Carlisle) 외곽에 위치한 1천200에이커(약 485만㎡) 규모에는 미식축구장보다 더 큰 아마존 데이터센터 7개가 우뚝 솟아 있다.
향후 수년 동안 아마존은 해당 부지에 약 30개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들 센터는 수십만 개의 특수 컴퓨터 칩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수십만 마일에 이르는 광케이블이 모든 칩과 컴퓨터를 연결하며, 이 복합 단지는 인공지능만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될 것이다. 이 시설은 220만 킬로와트(2.2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이다.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매년 수백만 갤런의 물이 칩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아마존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고객을 위해 건설되었다.
바로 인간 수준의 AI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루이지애나에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오픈AI(OpenAI)는 텍사스에 1.2기가와트 규모의 시설을,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의 그에 맞먹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2022년 챗GPT(ChatGPT) 출시 이전에 지어진 기존 대부분의 시설을 압도할 것이라고 한다.
◆AI 컴퓨팅 파워가 기져올 지각변동은
오늘날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엄청난 양의 특수 칩과 이들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즉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전력망 한계를 시험하고, 세계가 컴퓨터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디지털 미래 주권이 걸린 문제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기업은 외국 기업과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산유국들이 국제정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왔듯, AI 시대에는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그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AI 주권이다(Sovereign AI).
오늘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전의 이메일 송수신이나 영상 스트리밍을 처리하던 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강력한 칩들로 가득한 이 허브들은 수십억 달러의 건설비용과 특별한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는 없다.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컴퓨팅 파워를 독점한다. 그 결과 AI산업의 격차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시스템들은 컴퓨팅 파워가 집중된 국가들의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최고급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테크 기업들은 AI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과 같은 과학적 돌파구도 강력한 컴퓨터 성능에 기반하고 있다. AI 기반 무기 시스템은 실제 전장에도 등장하고 있다. 반면, AI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국가들은 과학 연구, 스타트업 성장, 인재 유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AI 의 에이전트의 역할과 공급망 구축
AI는 정보를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를 만드는' 혹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민주화한다. AI 에이전트(Agent)가 하는 역할이다.
이제는 엔지니어에게 연 20만 달러를 급여로 지급해야했던 지능(intelligence)이, 이제는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된다. 초기 페이스북(Facebook) 정도는 휴대폰으로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AI에이전트가 하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그 자체다.
이렇게 AI 에이전트에게 명령만 하면,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지 않고도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엄청난 변화다.
최근 미 코넬대의 두 학생이 AI가 생성한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기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만들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
여기서 수백만 달러의 연간 수익을 벌고 있다. 벤처 투자도 아니고, 투자자도 구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회원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로스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의 자카리 야데가리는 'Cal AI' 앱을 만들었다.
음식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약 90% 정확하게 칼로리를 분석해준다. 6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참고로 자카리는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 및 스탠퍼드 대학에 모두 입학을 거절당한 학생이다. 이 역시도 엄청난 변화다. 예전에는 학위를 따고, 공인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자격주의(credentialism)'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최대한 의존하지 않는 AI 공급망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AI 산업 투자 펀드가 2024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출자액 600.6억 위안(약 82억 달러) 규모다.
국가 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Big Fund Phase III)는 2024년 기준 등록 자본 3천440억 위안(약 475억 달러) 규모다. 베이징, 선전, 광둥 등 주요 AI·로보틱스 허브 도시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약 13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
BAT (Baidu, Alibaba, Tencent) 등 기업들도 향후 클라우드∙AI 인프라 투자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영 벤처펀드 및 기술전환펀드도 2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언(言)'보다 '행(行)'을 우선하는 게 '실용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닐까?
마크 주커버그는 AI 인재를 얻기 위해 3명의 인재들에게 1억 달러를 연봉으로 제시했다. 한 명의 인재가 이직을 사양하자, 그가 다니는 회사(Safe Superintelligence)를 통채로 매입해버렸다. 320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한다. 삼성이 AI 인재를 찾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30만~40만 달러를 주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했다고 한다.
'언(言)'과 '행(行)', 그리고 AI 주권. 우리로서는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게 아닌가?
곽수종(리엔경제연구소, 경제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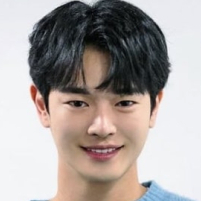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