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 무학산 자락, 아침 햇살이 이슬을 털어내며 능선을 따라 퍼져간다. 정갈한 숲길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발밑이 거칠어진다. 오래 손길 닿지 않은 비포장 길이 자작나무 숲을 굽이돌며 나를 이끈다. 그 길의 끝자락에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위에 상엿집 두 채가 단정하게 서 있다. 죽음을 예우하던 그 공간은 이제 삶의 본질을 되묻는 '나라얼 연구소'가 되었고, 그 곁에 나지막한 부속 건물들이 서로를 감싸 안은 듯 다정히 앉아 있다.
동네 사람들이 철거하기로 했던 300여 년 된 상엿집은 우여곡절 끝에 영천에서 옮겨져 중요 민속문화재 266호로 지정되었다. 전통 상례 관련 유물 1,200점도 함께 보존되면서 국가문화재로서 생명력을 얻었다.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는 매달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가 열리고, 다양한 상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언제든 죽음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매년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과거의 상여문화가 공동체 예술로 되살아난다.
나무로 짜인 상여 하나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떠오른다.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그러나 눈물처럼 가볍게 떠나는 마지막 여정. 앞에서는 상두꾼이 휘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하고, 뒤에서는 검은 저고리에 흰 띠를 두른 이들이 망자의 이름을 되뇌며 걷는다. 그 길은 울음의 행렬이자 기억의 행렬이며, 공동체의 숨결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것은 상주만의 이별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떠나보내는 공동의 의식이자 위로였다.
그 장면이 떠오른다. 평소 건강하시던 장모님께서 구십 해의 삶을 마치고 조용히 숨을 놓으셨을 때, 그분의 숨결은 바람이 되어 떠났다.
처가의 형제들이 모두 외국과 타지에 살고 있었기에 장모님은 늘 함께 지내셨고, 네 명의 증손녀들이 보여주는 재롱에 즐거워하시며,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해주시던 분이었다.
그러나 침대 가장자리에서의 작은 낙상, 갈비뼈 하나의 금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다장기부전'이라는 진단 아래 삶을 마무리하셨다.
그 며칠은 오히려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내어 모두의 얼굴을 알아보셨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짧지만 깊은 작별을 나누었다.
죽음은 시간을 멈추었지만,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이를 새기게 되었다. "오래 아프지 말고, 가족 다 보고 가고 싶다"던 장모님의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떠남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슬픔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지난 기억을 꺼내고 마음을 열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문이라는 것을.
장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하나로 엮는 따뜻한 연결고리로 남으셨다. 떠나셨지만, 그 숨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처남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모두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가 영희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작은 손을 모은 기도 속에서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목소리가 사라질 만큼 오래오래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건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삶이 힘들어도, 마음을 잃지 않았던 어른들 덕분이에요. 그 믿음과 사랑이 이어져서, 장난꾸러기 혜주와 주하와 세영이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기를 바래요."
이 기도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다. 경산 무학산의 나라얼 연구소에 오는 아이들도 죽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라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다.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삶은 더욱 농밀해지고,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은 더 깊이 새겨진다. 그런 성찰이 모여야 이 사회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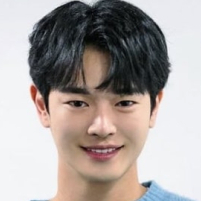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