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 문화의 원천으로 세 문명을 제시했다. 전쟁의 신 아레스를 숭배하는 스타르타 문명, 오딘을 숭배하는 스칸디나비아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다.
앞의 두 문명이 군사주의를 지향한 반면 기독교 문명은 전쟁에 반대하며 팍스 외쿠메니카(Pax Oecumenica), 즉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땅의 평화'를 지향했다. 토인비의 걱정은 현대에 들어 전쟁을 억제하던 기독교 문명의 힘이 현격히 약해진 것이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긴장으로 이어지는 위기 속에 2025년 경주 APEC이 개최된다. 전란의 몸살을 앓는 2025년의 세계는 새 시대의 문명사적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주권의 고대 해양 정체성, 서라벌 범해 문명을 말할 수 있다. 범해(氾海)란 물 뜰 범, 바다 해로 서라벌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최치원의 시 제목이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2013년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직접 '범해'를 암송했다. "배에 돛을 달아 푸른 바다에 띄우니 긴 바람 한 번에 만 리까지 이르네."(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라는 첫 구절이었다. 시진핑은 이 시가 우호 교류를 통한 평화 번영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극찬했다.
서라벌은 오랜 세월 동서양 우호 교류의 거점이었다. 서라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중앙아시아, 장안을 거쳐 이어진 유라시아 육상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다. 동시에 서라벌은 토함산 너머 감포에서, 또 태화강 아래 개운포, 사포에서 떠나는 인도 태평양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인연들이 배로 서라벌에 오고 또 갔다.
서라벌인들의 항해는 '발할라'를 외치며 대서양을 약탈했던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의 항해와 다르다. '자르릭(몽골 황제의 칙령)!'을 외치며 사할린부터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배를 관철했던 쿠빌라이 시대 몽골의 항해와도 다르다. 서라벌은 침략이나 정복의 항해가 아닌 교역과 배움, 사랑과 결혼의 항해를 추구했다.
가야로 와서 결혼한 인도계 이주민들은 결국 서라벌인이 되었다. 석탈혜왕도 남방계 이주민이었다. 9세기에는 아랍계로 추정되는 처용이 등장하여 서라벌 밝은 달밤에 다른 남자와 누워 있는 아내를 목격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서라벌 문명은 작은 얼굴로 세상을 편력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을 음미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여행자의 문명이다. 최치원은 '범해'에서 "해와 달은 허공 밖에 있고 하늘과 땅은 태극 안에 있네. 봉래산이 지척에 보이는 듯하니 나는 이제 신선을 만나보리라."라고 노래했다.
더 광대한 세계로 나아가며 작은 나를 내려놓는 탈속과 자기 해방. 이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상호 존중과 공감이 서라벌 범해 문명이었다.
2025 경주 APEC은 여러 가지 어젠다로 서라벌 범해 문명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날로 전운이 고조되는 세계에 '해양 평화 교류 협력 선언'을 제창할 수 있다. 둘째, 인류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북극 항로에 대해 'AI 기반 북극 해양 정보 공유 체계'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해양 AI 데이터센터와 해양 자원의 개발을 위한 '해양 자원 혁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세계 조선 능력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국제 조선 역량 공동 개발 기구'를 결성할 수 있다.
APEC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되며 관심은 매년 이동한다. 일단 '세계 경주 포럼' 같은 형태의 공동 협력 모델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와 문화의 포럼으로 서구 문명들의 바깥에 서라벌이라는 또 다른 보편 문명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보자. 어쩌면 그것은 7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약자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 60세까지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또 다른 형태의 스파르타 문명인 서울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유철균(경북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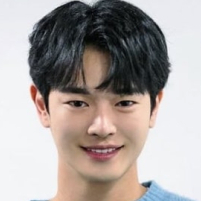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