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인사의 표절(剽竊)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절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문제이자 학문적·예술적 부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당사자가 그 심각성을 각성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표절은 창작 주체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 극단적인 예는 당나라 측천무후와 중종 때의 궁정 시인 송지문(宋之問)의 일화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문학사에서 송지문이 남긴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 등에 그의 광적인 표절 행각이 기록되어 있다.
송지문의 사위 유희이(劉希夷) 역시 탁월한 시인이었는데, 그가 "연년(年年) 세세(歲歲) 꽃은 비슷한데, 세세(歲歲) 연년(年年) 사람은 다르네"라는 시를 짓자, 송지문이 이 시를 탐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송지문이 노하여 유희이를 흙 포대로 눌러 죽였다고 한다. 과연 이 시는 문헌에 따라 작가가 유희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송지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은 당·송 시기에 문학 비평이 활발해지면서 표절을 본격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청나라 때의 고증학은 학자가 스스로 표절을 지양하고 정확한 출처 명시 및 비판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학문적 무결성을 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표절을 천한 도둑질로 간주하였으니, '과거 우리나라는 표절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남의 글을 훔치는 것을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고 하였다. '지봉유설'에 "옛날에 어느 사람이 남의 슬갑(膝甲)을 훔쳤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 이마 위에 쓰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이런 까닭에 지금 남의 문자를 도둑질해 잘못 쓰는 자를 일러 '슬갑도적'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슬갑'은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다 무릎까지 내려오게 껴입는 의류의 일종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용도를 바로 알기 힘든 물건이다. 그래서 '슬갑도적'은 남의 글을 무작정 훔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어설픈 표절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처럼 표절은 창작 주체의 욕망이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환상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창의성의 본질·지식 생산과 인정 욕구·권력 구조 등 여러 층위에서 살펴 봐야 하는 문제다.
표절의 유혹은 창작 주체의 인정과 권위에 대한 갈망에서 발생한다. 특히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인식과 언어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존재인데, 창의적 지식 생산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지적 권위를 취득하려는 욕망, 동료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다. 이러한 욕망은 연구와 창작의 원동력이 되지만, 때로는 표절이라는 잘못된 지름길을 택하게 만든다.
표절의 유혹은 욕망과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창작 주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창의성의 고갈을 겪을 때, 표절의 유혹과 타협한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업적 평가 시스템도 표절을 유도한다. 이러한 요인이 창작 주체의 욕망과 실현 가능성 간의 간극을 만들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표절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표절은 창작 주체가 갖는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로서, 창작 주체의 윤리적 실패이며, 창의적 생산 능력의 결핍을 드러낼 뿐이다. 더욱이 표절이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이 될 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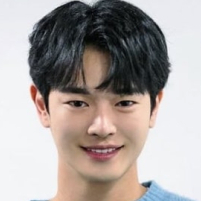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