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초반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료기기 판매원인 크리스 가드너는 한 달 방세조차 내지 못해 아들과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존 인물인 그는 매일매일이 처절했다. 잠잘 곳이 없어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던 그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희망은 무보수 인턴직으로 시작하는 주식 중개인이었다.
영화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크리스 가드너를 분한 윌스미스의 면접 장면이었다. 거지꼴을 하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면접관들의 인상은 당연히 구겨졌다. 그리고는 면접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가 셔츠도 입지 않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을 고용한다면 이유가 뭐겠나?"
라는 질문에 윌 스미스는 이렇게 답한다.
"바지는 끝내줬나 봅니다."
센스 있는 답변에 무거웠던 면접장의 분위기는 밝아졌다. 탈락의 반전을 이룬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광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모두가 초라하다고 말할 때, 브랜드는 본질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겉모습을 말할 때, 브랜드는 속모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광고에는 필수적으로 어떠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 집의 첫 차는 내가 창업 후 번 돈으로 산 250만 원짜리 중고차였다. 그래서 학창 시절, 집에 차가 없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던 것 같다. 한참 사춘기 때니 그럴 만도 했다.
그때 나는 가난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래 우리 집에 차가 없으니 차가 있는 집보다 더 건강할 수 있겠다. 항상 걸어 다녀야 하니 살도 안 찌고 좋네'라고 말이다.
사실의 부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였다면 나는 어쩌면 삐뚤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늘 사실 너머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연습을 했다.
더 불편하지만 그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뒤집어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놀랍게도 그런 훈련들은 내가 훗날 광고인이 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
광고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미지가 별로인 브랜드를 맡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어차피 학창 시절 내내 했었던 습관들이라 그런 작업들이 쉽게 느껴졌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브랜드가 참 멋진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서운해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행복을 찾아서의 윌 스미스 면접 장면를 떠올려보자.
"셔츠가 별로라고?
네가 몰라서 그래.
난 정말 멋진 바지를 입었단 말이야".
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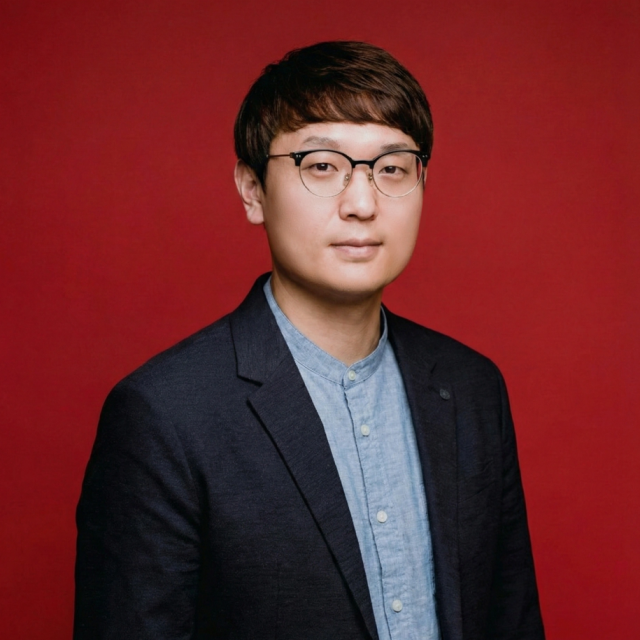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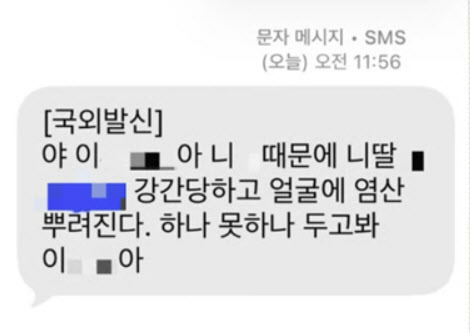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https://www.imaeil.com/photos/2026/02/05/2026020517375601025_l.jpg)























댓글 많은 뉴스
세상에서 가장 아릅답고 애잔한 오페라…'나비부인'과 '리골레토' 봄에 만난다
'갑질 의혹' 박나래, 디즈니 예능으로 복귀…11일 공개 확정
코트라, 지역 수출·투자 총력전…'5극 3특' 전략산업 집중 육성
"브레이크 밟았다" 70대 몰던 차량, 후진하다 약국으로 돌진…1명 심정지
'시애틀 vs 뉴잉글랜드' 美 슈퍼볼 누가 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