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년전, 고고학을 전공하는 모교수의 연구실에 들렀을 때 필자가 보기에 조금 다듬었다고 보여지는 돌덩어리가 연구실 모퉁이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 돌덩어리들을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어렵게, 그것도 많은 돈을 주었다기에 필자의 고향에 가면 이런 돌덩이는 많은데 주어다 드릴까요 하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공기와 물의 고마움이라든가, 곁에 항상 계시기에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대구지역의 오랜 역사와 산재한 문화유산 속에서 살아가기에 오히려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다.
대구는 신라시대에는 수도의 후보지로,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행정중심지로, 그리고 현대에는 한국의 3대 도시로 자리잡아 왔다. 수백,수천년동안 조상들이 대대로 살면서 가꾸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부족한 것은 보태고 제거하면서 대구지역 정서에 맞는 도시로 성장, 발전해왔다. 시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선시대 대구는 한반도의 중요한 지방도시로서 정치,경제,사상,종교,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역사성을 가진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되었는데, 조선시대의 읍지(邑誌)와 대구의 지도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대구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구조물은 경상도의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던 감영, 객사 등을 에워싸고 있었던 대구읍성(邑城: 약 2,650m)으로서 현재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를 연결하는 노상에 있었다. 거기에는 성내를 통하는 동서남북에 커다란 네개의 대문과 암문(暗門:성루가 없는 성문)이, 성곽 위에는 망루(望樓)도 있었다. 읍 성내에는 지붕 끝이 하늘로 젖혀 올라간 기와집 사이에 아주 높다랗게 치솟은 경상도 행정을 관할하였던 경상감영(慶尙監營)이 현재의 경상감영공원(구 중앙공원)에 위치하였다. 초하루 보름에 향궐망배(向闕望拜:대궐을 향해 절함)하고, 사신의 숙소로 사용하고 전패(殿牌:객사에 殿자를 새겨 세워둔,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를 안치한 객사(客舍)가 현 경북인쇄소 위치에, 조선시대 관설시장이었던 약령시장은 객사 주변부에 개설되었고, 대구부의 행정을 담당하였던 부아(府衙)는 현 중부경찰서의 위치에, 군사(軍事)에 관련한 진영(鎭營)은 제일극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 사이로는 납작한 초가들이 있었다.
읍성 외에는 공교육장이었던 향교가 읍성 동편, 현재의 향촌동에 있었고, 동서남문 밖에는 시민의 생활권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 본래의 여러 신(神)이나 유불사상의 영향을 받은 각종 사묘가 여기저기 있었다. 그중 사직단(社稷壇)은 읍성의 서편인 평리동에, 여단(미혼으로 죽은 혼들에 제사드리는 곳)은 읍성의 북편인 침산에, 성황당은 읍성의 동평인 연귀산에 위치하였고, 사교육장이었던 서원도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불교는 유교에 밀려 대부분 산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이외에도 조선시대 3대 시장인 서문시장, 그리고 서민생활의 근거지로 애환이 서린 골목인 떡전골목, 진(긴)골목, 덩겨진골목, 뽕나무골목, 엿장수골목 등은 대구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역이 됐고, 현재도 그 이름이 불려지거나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 십경(十景), 칠성동의 칠성바위, 팔공산,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등은 대구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것이 대구고을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이와같이 성내에는 관청과 민가를 함께 수용한 행정적, 군사적, 생활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는데, 주로 동서의 생활축과 남북(종로)의 행정축으로 성장,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 그렇듯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였는데,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 십경의 하나인 건들바위 동편의 천(川), 달성 동쪽 자연적 해자(垓字)천, 대구읍성 등은 복개되거나 철거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자연적,역사적 환경과 그 주변을 훼손한 예로 자연적, 역사적 문화공간의 질을 절감시킨 예이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방법은 대구의 도처에서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 변질되어 역사적인 맥락을 갖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역사적 환경과 자연환경은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거나, 또한 복구한다손 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랜된 것이라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따라서 버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할 것이다. 사상이, 신이, 전설이 없는 도시구성은 재미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건축가, 도시계획가, 도시행정가는 역사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해 마치 사학자의 연구실의 문화유산을 냇가에 나뒹구는 돌덩이로 보는 것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는 건축을, 도시계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즉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통적인 모습들을 발굴,조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이같은 전통의 바탕위에서 대구시민의 손으로 현대생활에 알맞는 전통적 맥락을 갖는 대구다운 도시로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여 명 해
대구대 교수·건축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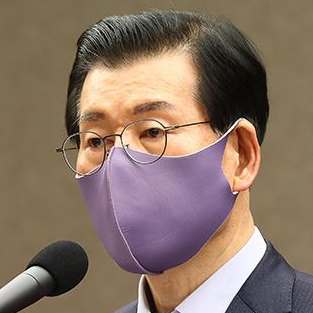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