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옛날 봄이 오면, 온 식구들이 하루종일 문짝에 매달려 헌 문종이를 물로 씻고 긁어내면서 새 문종이를 바르던 시절이 있었다.
새 문종이에 지난 여름 책갈피속에 끼워 말려 두었던 꽃잎들을 함께 덧발라 한껏 멋을 부리기도 했다.
이 문종이는 조선종이로 불리는 한지(韓紙)를 말한다.
한지는 문에 바르면 창호지(窓戶紙), 고서 불경 영인에 사용하면 복사지(複寫紙), 사군자와 화서를 치면 화선지(畵宣紙), 연하장 청첩장을 만들면 태지(胎紙)라고 하는 등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예전 한 중국 선비는 "조선 종이를 한번 실컷 써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했단다.
이처럼 종이에 관한 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일류국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종이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옛 사람들은 한지를 보면서, 봄날엔 따사로움을 느꼈고 동지섣달엔 삭풍에 떠는 문풍지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또 시심(詩心)이 절로 우러날 정도로 한지엔 멋과 운치가 넘쳐났다.
우리나라에서 한지를 언제부터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학자마다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소한 불교가 전래된 고구려 소수림왕(371~384년)이후 전래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처음엔 중국의 제지(製紙)기법을 모방했으나 삼국시대들어 종이의 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됐다.
일본에서는 한지를 화지라고 부른다.
지금도 일본의 학자, 예술가들은 안동의 한지공장 등에 주문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었던 한지는 명맥이 완전히 끊길 위기에 놓여있다.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최고의 한지 고장이었던 전주는 물론, 전국 곳곳에 있던 100여 한지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도 거의 사라졌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안동과 강원도 원주, 충북 괴산 등 3곳 뿐이고 전주도 어쩌다 1, 2곳이 가끔씩 공장을 돌리다 만다 한다는 것.
한지공장들이 사라진 것은 한지 소비 자체가 과거보다 크게 준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면서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산 종이는 국내산 한지값의 30~50%선에 그쳐, 서울 인사동에서 거래되는 전체 한지 물량 중 90%는 중국산이 차지할 정도다.
안동 풍산한지공장도 해마다 판매량이 격감하면서 10여명 기술자 및 종업원들의 급료 맞추기에도 급급하다.
게다가 한지 원료인 닥나무 확보도 여의치 않다.
생산 둔화로 인해 안동과 예천 의성 등지의 농가들이 닥나무 생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는 닥나무를 원료로 생산해 과거 '닥종이'라고도 불렀다.
껍질을 벗겨 내피(內皮)만을 10시간 정도 잿물과 함께 삶아야 하는 등 작업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풍산한지 초지(秒紙)공인 김재식(57)씨는 "전주에서 한지 제조를 배운 뒤 최고의 한지를 생산한다는 자존심 하나로 34년째 버티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외면해 힘들다"고 말했다.
문화관련 당국도 한지공장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명맥을 잇는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안동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재해있고 유교문화와 한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한지생산 명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풍산한지 이영걸(64)대표는 "비록 빛이 바랬지만 한지는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면서 "지금 마지막 끈을 붙들고 발버둥치고 있는 입장"이라며 안타까와 했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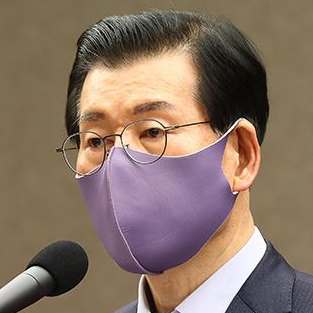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