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들은 서로 부딪치는 법이 없다
형제가 많은 집안의 네 번째 K는 이번 명절을 즐겁게 보내지 못했다. 여느 때처럼 다섯 명의 K가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사뭇 침울했다.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네 번째 K는 입도 벙긋해보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다섯 번째 K의 수심 가득한 얼굴이 입을 막았던 것이다. 다섯 번째 K의 얼굴이 안타깝도록 많이 상해 있었다. 밤길에 무단횡단을 한 60대가 그의 차에 치여 숨졌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다섯 번째 K가 감당하기 어려운 3억 원이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닌 끝에 합의금을 반으로 깎긴 했지만 해결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60대가 어두운 거리를 무단횡단으로 건너지만 않았어도, 다섯 번째 K가 무면허 운전만 하지 않았어도…….
네 번째 K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쇄추돌사고를 목격했다. 6중 추돌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앞차가 갑자기 멈추었고 뒤따르던 차들이 앞차의 꽁무니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차간거리만 유지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트럭의 앞뒤에 있는 승용차가 많이 다쳤다. 견인차와 경찰차가 달려왔고, 줄줄이 밀려 있던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제 갈 길을 갔다. 다들 나름의 일상이 있었다. 누구는 색다른 주말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테고, 누구는 사흘의 명절 연휴에 지쳐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테고. 앞차와 차간거리 100m 유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간격을 무시하다 종종 일을 그르치곤 했다.
가을 끝 무렵에 순천만에서 본 철새들의 군무를 생각했다. 언뜻 검은 구름 같아 보이는 새떼가 와선형으로 대열을 정돈하고는 맨 앞의 새를 따르고 있었다. 새들은 두 번 세 번 만을 휘돌아오면서도 그 대오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다. 하루를 잘 보냈다는 감사의 기도 같기도 하고, 축복의 날갯짓 같기도 한 새들의 군무를 목이 아프게 올려다보았다. 산마루에 깔리기 시작한 노을과 광활한 갯벌, 만 중앙의 수로를 가르는 여객선, 퇴색의 빛이 짙은 갈대숲 곳곳에서 들리는 새들의 건강한 우짖음…….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이 푹푹 빠질 것 같은 갯벌은 네 발 짐승들의 발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 천연의 요지에서 날고 싶으면 날고, 물에서 놀고 싶으면 놀며, 새들은 사위가 어두워지도록 군무를 계속했다. 새들은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부딪치는 법이 없었다. 먹이를 향해 달려들 때조차도. 그건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루쉰은 인생의 장도에 두 개의 난관이 있다고 했다. 갈림길과 막다른 궁지가 그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갈림길과 막다른 길을 헤치는 방법이 저마다 다를 것이다. 루쉰은 갈림길을 만나면 울지도 돌아가지도 않고 앉아 쉬거나 한숨 자고 괜찮을 만한 길을 택해서 걸어간다고 했고, 막다른 길에서는 가시밭길이라 해도 성큼성큼 걸어갈 터인데 온통 가시밭길이어서 결코 갈 수 없는 길은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설마하니 루쉰이 향년 56세의 생애를 살다 가며 막다른 길에 맞닥뜨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루쉰도 못 견디게 적막한 시절이 있었다. 그는 가끔 함성을 질러서 적막 속을 달리고 있는 투사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줌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싶다고 했다.
네 번째 K의 마음이 꼭 그랬다. 다섯 번째 K가 막다른 길에서 잠시 앉아 쉬거나 한숨 자고 가는 마음으로 루쉰의 글을 읽으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번째 K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승진의 기쁨을 감추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장정옥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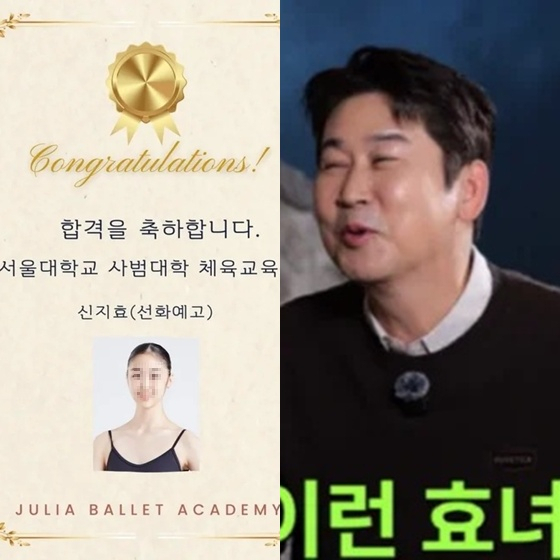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