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다란 양은냄비에 갓 잡은 생선과 해산물, 콩나물, 고춧가루, 마늘 양념장, 국수 등을 듬뿍 넣어 걸쭉하게 끓인 구룡포 모리국수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바닷가의 한파를 녹여주고 어민들의 허기진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준다. 구룡포 어민의 애환을 고스란히 지닌 채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리국수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 힘든 작업을 마친 뱃사람들이 '얼큰하고 화끈한 맛'에다 막걸리를 곁들여 언 몸을 녹이며 즐겨 먹었던 구룡포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엄동설한에도 아랑곳없이 외지에서 모리국수 마니아들의 발길이 쇄도할 정도로 겨울철 인기음식으로 각광받는다. 흔히 내지에서 접하는 속풀이 해장국처럼 시원한 맛도 맛이지만 냄비에 담긴 양이 워낙 많고 얼큰한 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장면은 다반사이고, 한 그릇 먹기 위해 밖에서 추위에 떨어가며 순서를 기다리는 마니아들을 구룡포 모리식당에서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땀 없이는 먹기 힘든 모리국수
40여년 동안 구룡포읍내에서 '까꾸네 모리식당'을 하고 있는 이옥순(67)씨는 음식 주문도 받지않고 냄비부터 불에 올려 놓았다.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데 주문은 무슨…"이라고 설명하는 이씨는 두 개의 냄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익힌 아귀와 아귀 내장, 미더덕, 대게, 미역초(바다메기), 열합 등을 한 움큼씩 넣고 콩나물, 파, 고춧가루, 마늘로 다진 양념장을 섞어 10여분 동안 끓였다. 보기에도 군침이 돌고 잔뜩 입맛을 자극하지만 다른 냄비에서 끓여진 국수를 부어 또다시 끓인 후 식탁에 내놓았다.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아귀 내장을 이용하고 부드러운 생선 맛을 내려고 미역초를 재료로 쓴단다. 가끔 대게가 준비되지 않으면 새우를 재료로 쓰기도 한다.
취재 일행 셋이 식탁에 앉았으나 냄비가 넘칠 정도의 푸짐한 양에 먼저 기가 질렸다. 반찬이라고는 달랑 김치 하나.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 칼칼하고 뜨거우니 빈 그릇에 덜어서 먹고 보통 막걸리와 곁들인다"는 이씨의 얘기에 따라 '구룡포 막걸리'를 반주삼아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먹으니 이마에서 땀이 절로 줄줄 흐른다. 해물이 많이 들어갔으나 비린 냄새가 전혀 없고 대게로 낸 국물이 껄쭉하고 시원하면서도 달큰한 맛이다. 미더덕 터지는 냄새로 입안에서는 상큼한 바다 기운마저 감돈다. 대게와 생선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살을 발라먹는 재미도 솔솔하다. 국물을 흘려도 타박하지 않는다. 누가 그릇에 담아주지도 않고 훌훌 불며 많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에 깔끔을 떠는 것보다 왁자하게 먹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다.
3명 모두가 땀을 쏟으면서 양껏 먹었으나 결국 냄비를 비우지못해 모리국수 달인인 주인장에게 은근히 미안했다. 그러나 1인당 5천원, 모두 1만5천원에 막걸리 값 2천원을 치른 일행은 "지난해부터 매주 맛 취재를 하면서 가장 싼 가격으로 맛있고 푸짐하게 먹었다"며 한목소리로 촌평을 내놓는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영천과 영덕, 포항에서 각각 계모임으로 온 3쌍의 부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모리국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허본(58·포항 해도동)씨는 "지인의 소개로 10년 전부터 단골"이라며 "시원하고 담백한 바닷가 해물탕 맛에 반해 주말과 휴일 점심 때는 구룡포 식당 가운데 밖에 줄 서서 기다리는 유일한 곳"이라고 거들었다. 철제 원탁 탁자 4개와 작은 방 1개가 고작인 영락없는 어촌의 허름하고 비좁은 음식점임에도 주말과 휴일에는 200~300여명씩 몰린다. 하지만 예약을 받지않고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차지한다. 영덕 강구읍에서 횟집을 하고 있다는 손호림(39)씨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오늘 처음 먹어보니 말 그대로 맛이 일품"이라며 평했고, 영천에 거주하는 신철(52)씨는 "냄비 하나를 놓고 부부끼리 땀을 흘리며 막걸리도 곁들이니 색다른 경험"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추억을 자극하는 모리국수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모디'(모아의 사투리)넣고 한 사람씩 따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냄비채로 '모디가 먹는다'고 모디국수로 불리다가 모리국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음식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린다"고 말한 게 입으로 전파되면서 모리국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일본인 집성촌이던 구룡포지역 특성으로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모리'에다 푸짐한 양 때문에 모리국수로 불리게 된 것이라는 설이 현지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룡포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인천과 함께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수산물 어획이 번성했고 사람과 돈이 이곳으로 몰렸다. 대게가 걸리면 그물이 망가진다고 해서 발로 밟아 바다에 던졌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당시 구룡포에는 수산물이 넘쳐났음을 말해준다. 배를 타고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은 속을 따뜻하게 풀어줄 국물이 반가웠고 우후죽순처럼 생긴 모리국수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구룡포 어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모리국수 식당도 쇠락해 이제는 단 2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서민 대표음식으로 모리국수가 재조명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영화를 누렸던 구룡포의 옛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향토음식산업화특별취재팀 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사진·프리랜서 강병두 pimnb1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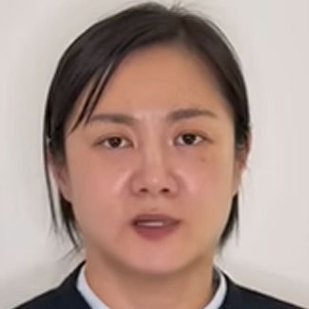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