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렌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아르노(Arno) 강이 만든 뛰어난 자연과 산타마리아 델 피오래 성당과 시뇨리아 광장, 우피치 미술관 등 역사문화유산이 빼곡하다. 기원전 59년 카이사르가 '꽃의 마을'이라고 작명한 이 도시에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연 메디치 가문 덕택에 피렌체는 풍부한 볼거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관광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35만 명의 피렌체 시민들은 관광도시라기보다는 섬유패션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경제적 번영은 12세기부터 발전한 세계 최초의 양모길드(Arte della Lana), 실크길드(Arte di Por Santa Maria)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은 다양하다.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긍지를 표현한 것도 있고 능금도시, 미인도시라는 애교스런 것도 있다. 섬유패션도시도 그 한 가지다. 대구를 상징하던 섬유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는 다소 퇴색한 느낌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대구는 섬유도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공장이 1915년 대구에서 시작된 것만 봐도 근거는 충분하다. 1920년대 달성공원 부근에는 20여 개의 직물공장이 생겨났고, 1960년대 섬유산업은 가히 산업혁명에 비유할 정도였다. 통계에 따르면 1963년도 대구의 섬유수출은 235만달러로 우리나라 섬유 수출의 92%를 차지했다.
명주와 생사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대구는 화섬과 모직, 염색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고, 세계 최대의 합섬직물생산지로 성장해왔다. 1987년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합섬직물 수출국으로 등극했으며, 대구가 단연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가 닥친데다 고기능화, 다양화된 섬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물량위주의 출혈경쟁에 나서면서 섬유산업은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살리기 위해'밀라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대구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섬유산업 업체 수는 3천460개로 제조업의 13.8%, 종사자는 2만6천 명으로 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피렌체의 섬유패션산업도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으나 21세기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첫째, 모두가 대중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성복에 집중할 때 피렌체는 고급제품을 만들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피렌체에는 지역출신인 페라가모와 구찌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본점이 20여 개나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중소업체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둘째, 제품을 특화하면서도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피렌체 남쪽 산업클러스터에는 1천500개의 가죽공장과 6천 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며 연매출은 1조원에 이른다. 이곳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고급가죽제품들은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루이비통 등에 공동납품함으로써 피렌체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
피렌체의 성공 포인트를 대구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대구가 섬유패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섬유는 사양사업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는 적극적 발상이 필요하다. 다만, 제품 고급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산업이 있다고 패션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지양돼야 한다. 오늘날 패션의 중심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곳이다. 대구에서 섬유를 생산한다고 패션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한때 대구의 롤모델이었던 밀라노가 최근 세계 10대 패션도시에도 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신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종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 소재로 알려진 고어텍스의 출발은 원래 산업용 소재였다. 1981년 컬럼비아호 우주복에 고어텍스가 사용되면서 레저용 의류소재로 활용되었고 지금은 인공혈관의 소재로까지 활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대구가 섬유도시의 긍지를 찾으려면 시대에 뒤처져 가는 제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지역 업체들이 탄소섬유나 스마트섬유 등 첨단섬유(Cosmetotextile)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렌체의 섬유패션산업처럼 지역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영우/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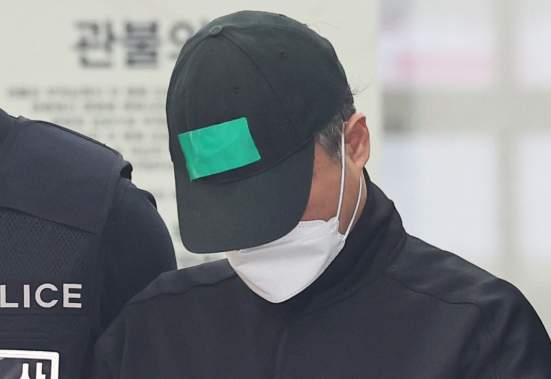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