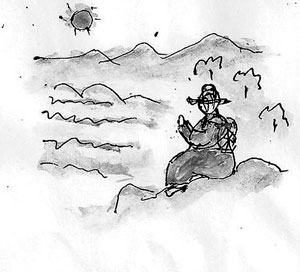
우리는 삼면을 바다로 하고 있다. 바닷가에서 보면 많은 경치를 볼 수 있다. 멀리 펼쳐지는 바다. 둥실 떠 있는 섬, 뭉게구름, 갈매기 울음소리 등 무엇 하나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자연환경들이다. 시인에게는 모두가 시적인 감흥이요, 주섬주섬 담아두면 한 올 한 올 모두가 시어다. 작가는 부산 해운대에 와 있다. 거울처럼 깨끗한 물, 떠 있는 붉은 해, 저 멀리 보이는 대마도를 눈썹으로 비유하고 있는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거울처럼 맑은 물결 바람도 한 점 없고
앉은 채 부상(扶桑) 바다 붉은 해 바라보니
대마도 속 눈썹인 양 건곤 가득 파고드네.
波恬鏡面淨無風 坐見扶桑日浴紅
파념경면정무풍 좌견부상일욕홍
馬島如眉靑一抹 乾坤納納入胸中
마도여미청일말 건곤납납입흉중
'어머나! 대마도가 보이네'로 제목을 붙여본 칠언절구다. 작가 무진(無盡) 권반(權攀'1419~
1472)의 할아버지는 찬성사를 지낸 근(近)이다. 음직(蔭職)으로 전농시윤(典農寺尹)이 되었다가 세조의 권유로 당상관으로서 식년문과에 급제했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으며 경기도절도사 겸 개성부윤을 지냈다.
위 한시 원문을 번역하면 '거울처럼 깨끗한 물결 바람 한 점 없고/ 앉은 채로 부상 바다 붉은 해를 바라본다/ 대마도 눈썹인 양 푸른 점 하나 긋고/ 건곤만이 가득 차서 가슴 속 파고든다'라는 시상이다.
부상(扶桑)은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신비한 나무이다. 동방삭(東方朔)이 지었다는 '해내십주지'(海內十洲志)에 의하면 "동해 동쪽 푸른 바다 가운데 사방 1만 리 되는 육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태제궁(太帝宮)이 있고 숲의 나무는 뽕나무와 비슷하며, 큰 것은 높이가 수천 길이요 둘레가 아름이나 된다"고 표현돼 있다.
시인은 날씨가 맑으면 해운대 동남쪽 멀리 지평선 너머, 대마도가 눈썹처럼 보이면서 하늘과 땅이라는 건곤(乾坤)이 가슴 속에 가득하게 들어 환하게 비춘다는 자기 심회를 담고 있음을 본다. 날씨가 좋은 날, 해운대에서 눈썹 끝에 점 하나를 그은 것처럼 아스라이 보이는 대마도를 보고 있다.
'건곤'이란 단어는 화자의 말을 빌린 시인이 세종 때부터 조선에 조공(朝貢)을 바친 대마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화자는 하늘과 땅이라는 원래 뜻보다 조선과 부속 도서인 대마도를 비유적으로 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독도 문제와 아울러 우리는 대마도 문제를 거론해야겠다.
찬성(贊成) 권제의 아들이자 우의정 권람의 아우인 권반은 조선 전기인 단종, 세조 때의 문신이다. 시호는 안양(安襄).
단종 때 계유정난(1453년)에 가담하였다. 세조 때 좌익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전농시소윤'중추원첨지사가 되었다. 과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가 특별히 시험 칠 것을 권유하여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고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화산군에 봉해졌다.
1450년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61년 형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한성부윤이 되었고 이어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1466년 경기절도사 겸 개성부윤을 역임하고 병으로 사직했다.
장희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시조시인'문학평론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