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중국의 가요집으로 B.C 470년경에 만들어졌다. 주로 서주(西周) 초기(B.C 11세기)부터 춘추시대 중기(B.C 6세기)까지 전승된 시가 많이 실려 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아들과 제자들에게 시를 읽지 않으면, 담벼락을 대하고 서 있는 것처럼 지식도 짧고 식견도 좁아진다고 했다. 시를 읽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아 공자 당시 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자가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도 탈 줄 알았다고 하니, 시의 가사를 음악에 맞추어 불렀을 것이다.
당시 약 3천여 편이 전해졌는데, 훗날 공자가 이를 300편으로 편집하였다고 하는 말도 전연 근거없는 추측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문학 교양'에 속한다. 오늘날도 문학이 인문학의 기본인 것을 보면 공자의 말은 매우 일리가 있다. 현재의 시 300편은 '풍'(風), '아'(雅), '송'(頌) 3종류의 장르로 나뉘어져 있다. '풍'은 '국풍'(國風)을 말하는데, 당시 각 나라의 풍토와 사회를 배경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일종의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조상의 공덕을 노래하는 서사적인 시를 말한다. 씨족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나중에 궁정과 귀족사회 연회에서도 불리게 되었다. '송'은 '아'와 같이 조상의 공덕을 가무로 재현하는 서사적 시를 말한다. 다만 왕의 사당, 즉 '종묘'(宗廟)에서 불린 점이 다르다. '아'와 '송'은 기독교의 '시편' 처럼 찬양'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외에 의례(儀禮)에 관한 것도 많아 외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 시의 백미는 '국풍'에 있다. 문학적으로도 그 후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일반인이 읽어도 전연 어색하지 않다. 민중의 소박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같은 형식이 반복되므로 첫 구절씩만 인용해 본다. '메뚜기' 메뚜기떼 많기도 하네, 너의 자손 번성하리라. '까치집' 저 까치집을 지으니 비둘기 날아와 사네. 이 아가씨 시집갈 때 수레가 마중하리. '떨어지는 매실' 내던지는 매실 일곱 개, 나를 찾는 사내들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장끼' 장끼가 날아오르네, 천천히 날갯짓 하네. 그리운 님이여! 내 마음에 괴로움만 남았네. 다음은 '아'이다.'소아'(小雅, 큰 다북쑥) 저 큰 다북쑥 이슬 촉촉하네. 님을 만나보니, 내 마음 후련하네. 잔치 벌여 웃고 이야기하니, 기분 좋은 말에 마음도 편안하네. '대아'(大雅, 문왕) 문왕(文王)의 영혼은 위에 계시고, 오! 하늘에서 빛나네. 주(周)는 오래된 나라지만 그 천명은 늘 새롭네(周雖舊邦, 其命維新). 혁명을 '유신'(維新)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고, 왕조시대 정치문화에서 각종 명칭과 상징어도 이 시에서 따온 것이 많다.
이동희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 dhl333@k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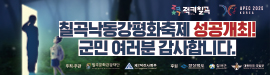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李 대통령 "韓日, 이웃임을 부정도, 협력의 손 놓을수도 없어"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제2의 건국전쟁'…서울서 성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