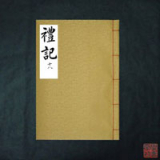
5경 가운데 하나인 '예기'를 소개한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매우 어려워 일반인이 읽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 2개의 편(篇, 작은 논문), 즉 '대학'과 '중용'을 골라내어 별도로 1권의 독립 고전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대학'과 '중용'이다. 그러고 보면 이 책에는 중요한 유학 관련 논문이 실려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글자 그대로 예에 관한 기록(논문)이다. 대성(戴聖)과 대덕(戴德), 두 사람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예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인데, 대략 춘추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이뤄졌다. 체계가 정연하지 않고 조금 잡다하다.
원래 유교의 핵심은 '예'(禮)이므로 이에 대한 책은 유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보통 '삼례'(三禮), 즉 3가지 예에 관한 중요 문헌으로 이 책과 더불어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든다. '주례'는 고대 왕조 주나라의 전장 문물제도를 적어놓은 책이고, '의례'는 고대 사회의 각종 '의례'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기'는 이 '의례'에 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례'는 고대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조사회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법전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제도개혁의 주장 속에도 자주 이 고전이 인용된다. '주례'를 매우 이상적인 통치원리, 제도의 모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의례'는 예 집행의 그야말로 형식과 절차를 적어놓은 것이다, 고대 사료로서는 참고가 되나 일반적인 고전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형식을 설명해놓은 '예기'를 중요시하고, '의례'와 유사한 딱딱한 글을 빼고 나면 또 읽기도 쉬워 자고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설명에 오늘날 윤리적 의미가 풍부한 글이라 하더라도, 유교의 윤리규범인 한에서 유교에 대한 일반적 이해 없이는 흥미가 나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는 '계율'이 있다. 유교에서는 이 예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 작게는 일상의 기거동작의 절도, 크게는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4례(四禮, 통과의례), 더 크게는 국가의 제도문물, 각종 의전 절차가 모두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로 연구한 것은 4례이고, 그중에서도 '상례'(喪禮)였다. 예는 공동체에서 신분 차등을 지우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개인행동의 절도와 절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상례를 중시한 것은 죽음의 문제와 함께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 dhl333@k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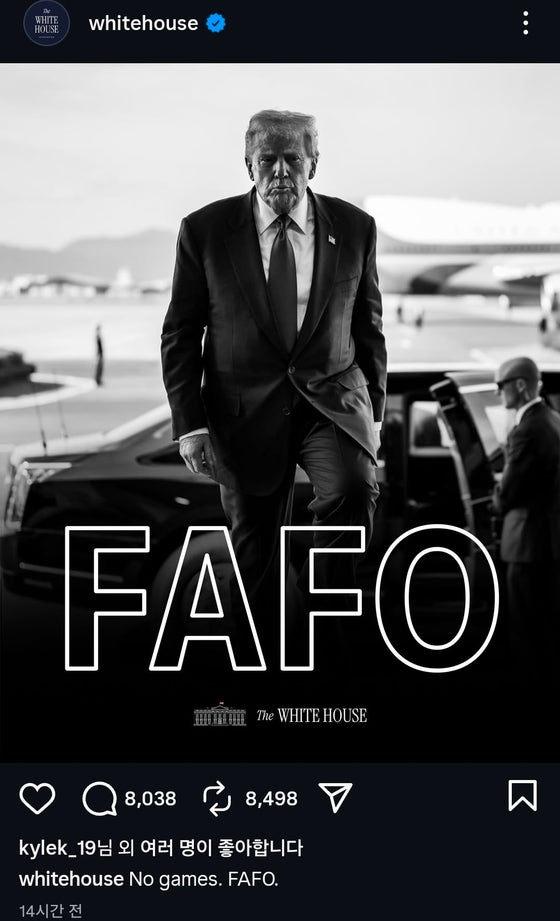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철우 경북지사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첫 삽 뜨자!"
"영종도땅 13→39억 뛰었다"…이혜훈, 갑질·투기 의혹까지 '첩첩산중'
"참을만큼 참았다" 오세훈의 '남탓'?…장동혁 "파격 공천혁신" 선언 배경은
李대통령 "이제 중국 미세먼지 걱정 거의 안 해…엄청난 발전"
국힘 "이혜훈, 10년간 재산 100억 늘어…탈탈 털리고 그만둘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