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환자의 가족으로 교통차단선을 넘어 탈출한 자, 나. 경관, 방역원, 기타 정동회장, 반장 등 지시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자, 다. 불결한 야채를 팔거나 가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자, 라. 환자의 대소변 기타 병독에 오염된 의심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자.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급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호 체형처분으로 처단할 방침이니~.'(매일신문 전신 남선경제신문 1946년 9월 12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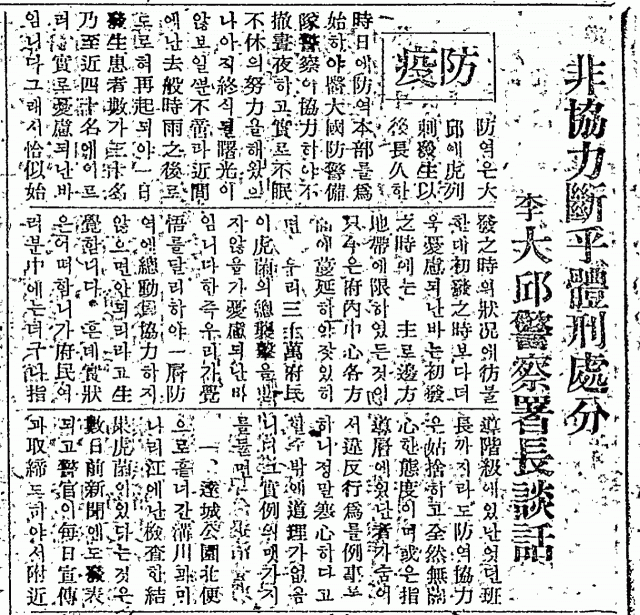
대구경찰서장은 이날 다급히 담화를 발표했다. 방역에 비협조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였다. 왜 그랬을까. 해방 이듬해 초부터 천연두와 발진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번졌다. 엎친 데 덮쳐 봄부터는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콜레라는 호열자(虎列刺)로도 불렸다. 호열자는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내듯 고통을 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경상북도에서는 5월 중순 청도에서 첫 호열자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순식간에 영천과 봉화, 경산, 군위 등으로 확산됐다. 더구나 그해 여름 대구에는 폭우로 인해 오염된 물이 넘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경북도청이나 대구유치장, 대구역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으레 환자가 발생했다. 30명이 거주하는 달성의 한 마을에서는 집단으로 감염되어 1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국은 전염병이 나돌면 머리와 몸에 뿌려서 이를 잡던 흰 소독약인 디디티(DDT)의 수입을 늘렸다. 하지만 콜레라에는 소용이 없었다. 먹는 음식과 식수 관리도 쉽지 않았다. 당시 대구의 하천에는 미나리꽝이 흔했다. 그런 하천에는 콜레라균이 득실거렸다. 일부 주민들은 병원균이 있는 미나리꽝의 미나리를 베어 팔았다. 또 걸레를 헹구고 옷가지를 가져와 빨래를 했다. 땀이 나면 어른들은 세수를 했고 아이들은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더위를 식혔다. 거기에 대소변을 보는 것은 예사였다.
대구부의 경찰 책임자가 이런 행위에 형벌을 가하겠다고 나선 이유였다. 이와 함께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요량으로 환자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 이동을 제한했다. 이른바 격리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탈출하는 일이 잦았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역 간 교통차단으로 그러잖아도 부족한 쌀의 공급이 막혔다. 쌀 한 말이 1년 만에 300원에서 1천200원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콜레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일도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이렇듯 전염병은 주민들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렸다.
경북도의 콜레라는 찬바람이 불자 잠잠해졌다. 그해 12월까지 7천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4천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일상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대비와 백신 개발 등은 전염병이 닥쳤을 때 불이 붙었다가 이내 사그라지는 일이 반복됐다. 눈앞의 이익만 좇는 인류의 고질병이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 이후에는 달라질까.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