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어떤 이는 선거 관리 경비 3천284억원을 유권자 4천380만 명으로 나눈 7천497원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의 정부 예산에 비춰 4천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한다.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이 한 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지난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리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선거권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선각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먼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 에밀리 데이비슨(Emily Davison)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03년 '여성사회정치동맹'이 결성되면서 본격화됐다. 열혈 운동가인 데이비슨은 아홉 차례나 수감됐고, 감옥에서도 단식투쟁을 벌였다. 1913년 데이비슨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관중이 운집한 경주마 대회의 트랙에 난입해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고 외치며 국왕 조지 5세 소유의 말과 충돌해 사망했다. 분노한 여성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거대한 시위 행렬로 만들었고 투쟁의 결과로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국민대표법'이 제정됐다.
다음은 미국의 흑인 참정권 운동가 아멜리아 로빈슨(Amelia Robinson)이다. 1865년 남북전쟁 종전 후 흑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얻었으나 참정권은 얻지 못했다. 백인들의 위협과 방해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일 자체가 힘들었으며, 남부주에서는 투표세를 납부해야 하고, 문맹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장치들이 있었다.
로빈슨은 '댈러스카운티 유권자연맹'을 결성하고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쳤으나, 백인들이 장악한 의회와 경찰의 방해는 집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65년 3월 7일 로빈슨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과 함께 셀마에서 주의회가 있던 몽고메리까지 86㎞의 평화 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곤봉과 최루탄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역사는 이날을 '피의 일요일'로 기록했다. 시위대를 이끌던 로빈슨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고, 이 사진이 신문에 실리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흑인 참정권 쟁취 운동에 불을 댕겨 결국 그해 존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투표권법'을 발의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무수한 희생을 딛고 어렵게 쟁취한 선거권이건만 현대 민주주의는 투표율 하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95.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에 머물러 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로 추락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도입해 투표일을 이틀 늘리는 한편, 상향식 공천제의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듯 투표율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데이비슨과 로빈슨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준 한 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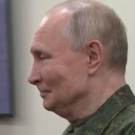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