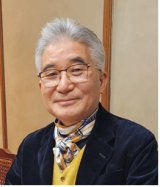
2014년 6월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토리노에 갔다. 두 곳을 방문했다. 수페르가 언덕의 수페리가 성당과 토리노 중심가에 있는 토리노 대성당이다. 수페리가 성당에는 매우 영험한 성모마리아상이 있고, 토리노 대성당에는 '토리노의 수의(Sindone di Torino)'가 있다.
수페르가 성당이 세워진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1706년 9월 2일 사보이아 공국의 공작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는 소수의 인원과 함께 적진인 프랑스군 진영을 살펴보고자 수페르가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도중에 성모상이 있는 간이 성당에 들러 "조국이 프랑스군을 무찌르면 성모 마리아를 위한 성당을 짓겠습니다"고 약속의 기도를 올렸다.
5일 만인 9월 7일, 사보이아 공국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와의 전생에서 승리했다. 프랑스를 처음 이긴 것. 이에 수페리가 성당의 성모마리아상이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졌다. 10년 뒤 아메데오 2세는 1717년부터 1731년까지 수페르가 성당을 지었다.
필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성모마리아상 앞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팔공산 갓바위 모습과 유사했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성모 마리아 시선(視線). 평소 불상의 시선에 관심이 많았다, 성모 마리아 시선에 따라 성당 밖으로 나왔다. 시선은 토리노 시내의 한곳을 향해 있었다. 곧바로 그 시선이 향한 곳으로 갔다.
깜짝 놀랐다. 토리노 대성당이라니! 이럴 수가! '토리노의 수의'가 있는 곳이 아닌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세마포'를 보관하고 있는 성당이었다. 그 수의에 대해 진위 논란이 있지만, 신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페리가 성당의 성모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들 예수의 피 묻은 세마포를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지평을 넘어선 '고귀한 사랑'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키워드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시선의 미학'은 한국에도 있다.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과 감포 앞바다 '문무왕 수중릉'이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동해를 보고 있다. 본존불의 시선이 '문무왕 수중릉'을 향해 있다. 정동이 아니라 약간 동남쪽 방향. 일제의 의도적 조작 때문으로 추정된다. 석굴암이 751년 김대성에 의해 창건될 당시에는 그 시선이 정확하게 '문무왕 수중릉'을 향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1915년 5월부터 1915년 9월까지 석굴을 완전히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본존불의 방향을 약간 틀었다는 것이다. 일제가 태양 숭배 사상에 따라 동지 때 해가 뜨는 방향으로 튼 것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동해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죽어서라도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문무왕의 넋이 '문무왕 수중릉'을 포함해 동해 전체에 담겨 있다. 토함산에서 '문무왕 수중릉'까지 직선으로 대략 10여km가 되는데, 토함산의 지기(地氣)가 지하의 암반을 통해 '문무왕 수중릉'까지 뻗어 있다.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죽어서도 이 나라를 길이 지켜 내자면 비늘 돋친 용이라도 돼야겠다. 내 죽으면 바다에서 하늘까지 뻗치는 호국용이 될 것이니 바다 속에 묻어 놔라'는 문무왕의 유지를 받들어 대왕암에 수중릉으로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감은사와 이견대(利見臺)도 지었다.
필자는 1981년 봄 해병대의 승인을 받아 대왕암을 탐사한 적이 있다. 거대한 바위에는 동서로, 남북으로 작은 인공 물길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깊고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신비스러웠다. 문무왕의 넋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문왕의 첫째 아들 효소왕에 이어 둘째 아들 성덕왕은 할아버지 문무왕을 위한 효심과 불심(佛心)으로 석굴암을 세웠다. 성덕왕은 김대성에게 본존불의 시선이 동남쪽의 '문무왕 수중릉'을 향하도록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할아버지도 지키고 '욕진왜병(欲鎭倭兵)하고자 동해의 호국대룡이 되어 저승에서까지 국가 수호의 집념을 잃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후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호국불교 성지가 됐다.
'호국(護國)'은 불교 경전 '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密經)'에 근거한 '진호국가(鎭護國家)'에서 유래한다. '진호국가'는 '불교의 교법(敎法)으로 난리와 외세를 진압하겠다'는 뜻. 원효의 일심(一心)을 토대로 통일신라 이후 '호국'은 한국 불교의 핵심 키워드다. 동시에 '호국'은 영남 정신의 토대가 됐다. 따라서 보수의 '적통'을 자부하는 영남이 이 '호국'을 잊으면 '영남혼(嶺南魂)'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한규(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철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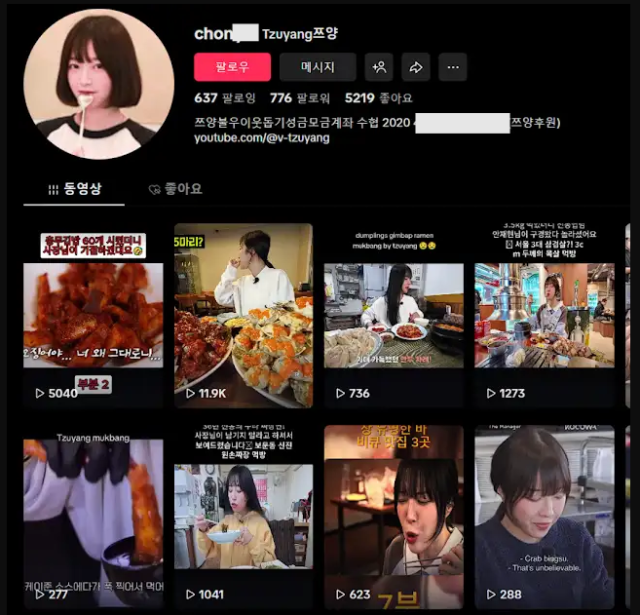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