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무려 246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예술감독이라는 타이틀은 우리나라 예술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서울시향,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지휘해온 그에게 더 높은 영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을 던진다. 과연 정명훈이라는 거장은 더 큰 영예를 위해 달려왔던 것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예술을 향한 태도가 그 영예를 불러온 것일까?
예술가의 동기와 삶의 목표를 연구한 예일대의 심리학자 폴 블룸교수는 예술가들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외부의 보상이나 명예보다는 스스로의 창작욕과 표현의 충동, 내면의 만족감이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유럽 문화예술 재단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예술가들의 78%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자기 충족"을 꼽았다. 반면 경제적 안정이나 명성은 그 비율이 15% 미만이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의 삶은 어떨까? 어느 온라인 채용 사이트가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경제적 보상'이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 다음을 이었다. '자아 실현'이나 '일에 대한 흥미'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도 있었다.
나는 지금 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며 예술가가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과정을 설계한다. 예술가가 아니면서도, 예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보낸다. 그래서일까? 회사원처럼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누군가의 예술적 성과를 돕는 일에서 나만의 사명감과 의미를 찾고 싶을 때가 많다. 실제로 승진이나 보너스처럼 수치화 된 평가만으로 내 일의 의미를 측정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을 움직인 한 편의 공연, 한 줄의 피드백이 내게는 더 큰 보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현실 속에서 예술가와 회사원 사이 어딘가에서 자주 흔들린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애써 생각하며 내재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은 차디찬 숫자와 마주하게 만든다. 반대로, 현실에만 초점을 두면 예술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동떨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괴로울 때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닌 균형이 아닐까 한다. 때로는 예술가처럼 열정과 사명으로 하루를 버티고, 때로는 회사원처럼 냉정하게 현실을 계산하며 방향을 잡는 것. 그 두 가지 태도를 필요에 따라 오가는 유연함이 이 일을 오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균형사이의 줄타기는 아마 이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을 막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나는 조심스럽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의 일은 피할 수 없는 예술적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현실속에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결국 예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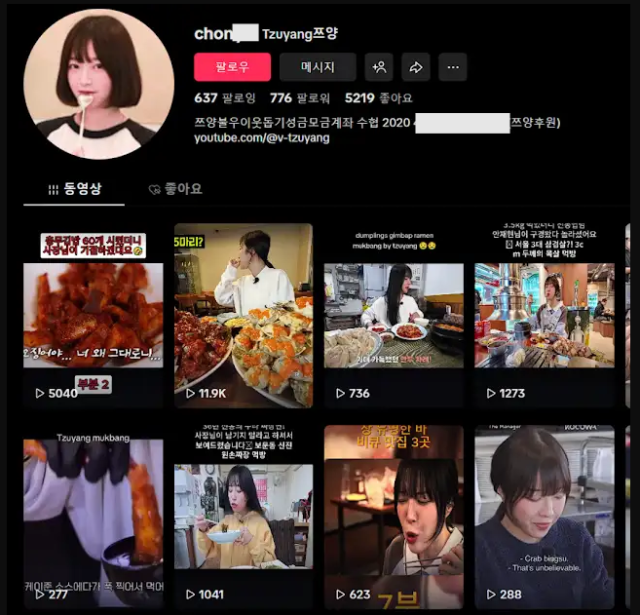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