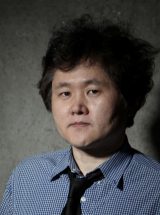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비는 오래전부터 예술의 서사 장치였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진 켈리는 우산을 든 채 빗속을 걷고, 뛰고, 춤추며 노래한다. 영화나 오페라 무대에서 비는 인물의 고뇌를 드러내고, 기다림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치로 쓰인다. 조명과 음향으로 구현된 빗속 장면은 사랑과 절망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극대화한다.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 에포닌은 빗속을 홀로 걸으며 'On My Own'을 부른다. 무대 위의 비는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는 징후다.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며, 때로는 숭고한 상징으로 소비된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두 주인공이 이별한 뒤 내리는 비, '기생충'에서 반지하가 침수되는 장면,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벽을 뚫고 빗물을 맞는 순간. 이 모든 장면에서 비는 서사의 밀도를 높이는 매개이자 전환의 신호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와 침수 피해는 더 이상 계절적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고된 재난에 가깝다. 빗줄기는 이제 영화 속 배경이 아니라 뉴스 속보의 전조이며, 누군가의 삶터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무대 위에서 감정의 절정을 표현하던 비는, 도시 공간에선 생존을 가르는 경계로 성격이 바뀐다.
문제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목격하고, 또 잊는다. 반복되는 재난의 풍경은 마치 고쳐지지 않는 대본 같다. 무대는 그대로인데, 매년 배우만 달라질 뿐이다.
예술은 반복을 통해 감정을 정제하지만, 현실은 반복을 통해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는 여전히 느슨하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도시는 갈수록 취약해진다. 하천 주변 저지대, 지하차도, 비탈길 주택에 사는 이들은 장마철마다 밤잠을 설친다.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본을 써야 한다. 무대 위에서처럼 반복되는 갈등은 이제, 다른 결말로 이어져야 한다. 장마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설계는 오페라처럼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가 사건의 계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대 밖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 처절한 주인공'이 된다.
비는 언제나 아름답지 않다. 때로는 무섭고, 잔인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던 예술적 상상이 현실의 경고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물에 잠긴 도시가 더는 '익숙한 풍경'이 돼선 안 된다. 진짜 막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결말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커튼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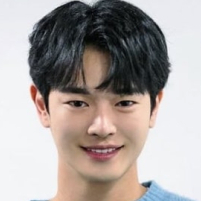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