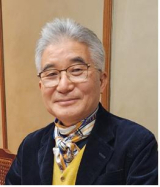
10년 전, 경주 양동마을의 한 식당 작은방에서 점심을 한 적이 있다. "어! 이거 무슨 책이야!" 너무나 반가운 책이 눈에 띄었다. 주인장 책상 위에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일반 식당에서 보기 쉽지 않은 고전(古典)인 '대학'과 '중용'을 보고 잠시 흥분한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해 농가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한 앙리 쥐베르 프랑스 해군 장교는 '쥐베르의 조선 원정기'에서 이렇게 외쳤다. "극동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쥐베르가 받은 느낌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한다. 필자도 양동마을에서 받은 느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사했다.
양동마을은 2010년 7월 31일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기와집의 수가 전국 최다이며, 이를 포함해 국보 1점, 보물 5점, 국가민속문화유산 12점, 경북지정문화유산 8점 등 도합 26점의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하지만 양동마을은 이런 문화유산을 뛰어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이언적 선생의 '혼(魂)'이 담겨 있는 마을이다. 그러니 식당에도 동양고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마다 식당마다 그런 고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1491년 양동마을에서 태어났다. 1514년 문과에 급제해 예조판서, 형조판서, 좌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종묘의 명종 묘정에 배향됐으며, 문묘에 종사됐다. 옥산서원 등에 제향됐다.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과 함께 '동방오현(東方五賢)으로 추존됐다.
그러나 선생은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자옥산(紫玉山)에서 7년간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특히 선생은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돼 강계에 유배됐고, 그곳에서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봉선잡의(奉先雜儀)' 등의 많은 저술을 남긴 후 한(恨)을 품은 채 세상을 마감했다.
선생은 누가 뭐래도 영남학파의 종장이다. 主理論(주리론)을 정통으로 확립해 퇴계 선생에게 전해줬다. '理는 마음에 있으며, 道는 가까이 있다'는 가르침은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선생의 정치철학과 그 정책적 구현이다. 전주 부윤 시절 중종에게 올린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가 단적인 사례다. 이는 오늘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1강(綱)은 '취기정군심(取其正君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각론에 해당하는 10개의 목(目)은 다음과 같다. ▷엄가정(嚴家庭) : 집안을 엄숙하게 다스림. 가도를 바르게 함. ▷양국본(養國本) : 세자를 바르게 교육함. ▷정조정(正朝廷) : 조정을 바로 잡고 기강을 세움. ▷신용사(愼用捨) : 인재 등용의 취사선택을 신중하게 함. ▷순천도(順天道) : 하늘의 도리에 순응함. ▷정인심(正人心) : 어지러운 인심을 바로 잡음. ▷광언로(廣言路) : 언로를 넓히되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음. ▷계치욕(戒侈欲) : 사치와 욕심을 경계하며 검소하게 생활. ▷수군정(修軍政) : 군사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런히 함. ▷심기미(審機微) : 현재의 기미는 물론 미래의 기미도 잘 살핌.
당시 중종은 이 상소를 수용했다. 선생을 한 자급 올려 경관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경연 및 세자 교육을 강화했다. 장수와 수령을 잘 선택해 임명했다. 나머지 십목(十目)의 항목들도 시행했다. 그러자 정치의 큰 흐름이 선생의 주장대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권발(權橃), 이황, 김인후(金麟厚), 유희춘(柳希春) 등과 뜻을 같이하며 사림 정치의 문을 열었다.
이언적 선생은 '대학'·'중용'을 깊게 천착했다. 주희(朱熹)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론에 머물지 않았다. 왕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을 제안했다. 행정은 물론 정치도 혁신했다. '지식 정치'의 문을 연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그나마 유교 전통이 남아 있는 대구경북에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는 안동에서, 양동마을의 각 가정에서 아침이면 '대학'·'중용'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가. 영남 지식인들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가. 퇴계학에 머물지 않고, AI시대를 선도하는 'K-철학' 창출을 기대한다.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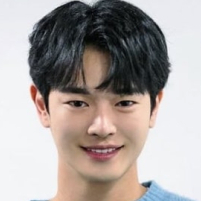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